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ㅣ 블랙 앤 화이트 시리즈 72
마쓰이에 마사시 지음, 김춘미 옮김 / 비채 / 2016년 8월
초등학교 시절 방학 과제물로 모형 만들어 오기란 제목 하에 공작 숙제가 있었다.
그럴 때면 항상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촌 오빠가 집에 들렀다.
지금도 유행하는 광고 음료 상자를 약국에서 갖고 오면 먼저 연필을 잘깍고 하얀 종이에 대충 쓱싹쓱싹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저기 고갯짓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느샌가 하얀 종이는 그냥 하얀 백지가 아닌 하나의 건물이 우뚝 선 모습으로 변형이 된 종이로 되어 있었다.
그 옆에서 엎드려 오빠가 무엇을 그리는 것일까? 연신 오빠 쳐다보고 종이 쳐다보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음료 상자는 2층 양옥집으로 변신을 한다.
위에 옥상이 있고 그 옥상에는 나무와 작은 채소밭이, 아래에는 층마다 빗물받이와 함께 창이 닫혀 있는 곳도 있으며 열려 있는 곳도 있고 마당에는 개와 개집, 그리고 쉴 수 있는 작은 마루 형태의 사각형 의자와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다.
한 순간에 변해버린 변신의 상자는 내겐 커다란 충격과 놀람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공작 모형은 오빠의 손에 해결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였을까?
결국 오빠는 건축학과에 들어갔고 졸업할 즈음엔 학교에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 학교 건물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카 아이도 지금 건축을 전공하고 있다.
당시의 연필이 스쳐 지나가면서 완성되어가는 설계도를 보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에 관한 노벨상을 누가 탔다더라, 아니면 여행 중에 보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처럼 눈과 귀로 보는 실제의 건축물은 기본이지만 책을 통해서 고스란히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작가의 대단한 필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앉아서 바로 그 지역의 건물을 보고 싶다는 유혹을 느낀다면, 저자로서의 기쁨은 무척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만에 건축에 관한 책을 접했다.
그냥 전문적인 건축에 관한 책이 아닌 자연과 그 계절에 걸맞은 향기와 풀벌레 소리, 새소리, 창을 열면 환한 태양이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면서 전체적인 채광을 밝게 해준다는 느낌을 고스란히 독자가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책-
사실 이야기는 짐작해보건대 50이 약간 넘은 ‘나’가 23세에 처음 발을 들였던 건축 사무소 사장님이었던 노 건축가의 여름 별장에서 보낸 한 달 여남은 기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별장을 찾아서 여러 감상에 젖는 이야기를 그린 책이다.
젊은 신입사원을 뽑지 않기로 유명한 건축 설계 사무소에 자신이 그린 설계와 신입사원으로서의 채용을 바란다는 내용을 보낸 이후 정말 놀랍게도 채용이 된 나의 이름은 사카니시 도오루다.
평소 존경하던 무라이 슌스케의 설계 사무소에 직원이 된 후 매년 여름 동안 사무실을 도쿄에서 여름은 가루이자와로 옮겨 설계에만 전념하는 이색적인 회사로 그려진다.
여름 별장에서 온 직원이 합숙을 하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잔잔한 일들은 무라이 슌스케의 새벽 산보로 시작해서 도시보다 맑은 공기와 그 탓에 일찍 찾아오는 어둠과 가슴이 탁 트일 정도의 공기 냄새, 장을 봐오고 음식을 만들면서 설계에 관한 토의를 하는 일반적인 일들을 그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 냄새 외에 건축가로서 건축을 바라보는 자세와 신념, 긍지,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그려져 있기에 건축에 문외한인 사람들이라도 하나의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데에 걸리는 노고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분들을 경탄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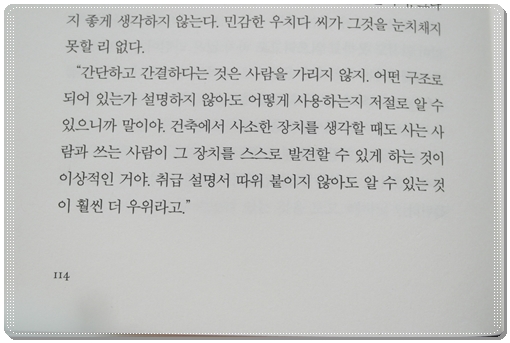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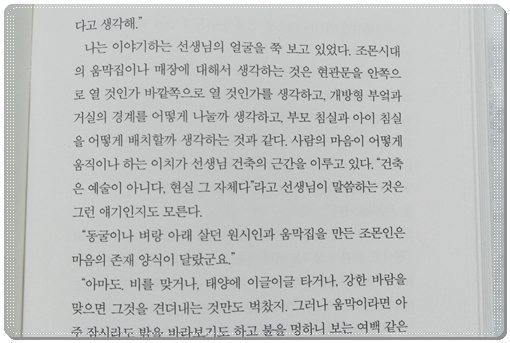
여기에는 물론 로맨스도 들어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란 인물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있다는 점과 실제 문무 장관의 부탁으로 국립현대 도서관 설계 공모전에 응하기 위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모형 제작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가는 절차들이 그려져 있기에 이 책에서 보이는 건축과 그 건축물 안에서 실제 사용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노라면 작은 소품처럼 다뤄지는 문고리 하나라도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으로 맞추려는 노 건축가의 의지를 엿보는 점들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책 속에 나오는 스톡홀름 시립도서관과 숲의 묘지는 그런 점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도서관 이용자들의 실용성과 호감을 이끌만한 군데군데 요소적인 부분들이 건축물이란 이름 하에 어떻게 건축이 되는지에 대한 새롭게 ‘앎’이란 이런 재미구나 란 것을 느끼게 해 준다.
일본인다운 노년의 건축 설계사무소를 마무리 짓는 과정도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 느끼는 중년의 ‘나’가 다시 느끼는 여름 별장의 의미, 독자들은 이 책을 집어 든 순간 벌써 그 여름 별장으로 달려가 있을 것이란 확신을 들게 하는 책이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 독자, 굳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건축이란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여름의 풀벌레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