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북부지방 라굼은 오지중의 오지였습니다.
강은 군데군데 펼쳐져 있는데다 다리도 없고 물은 금방 급류를 만들었다가 도랑이 되기도 하고 도랑인 줄 알았는데 큰 물살이 되어 앞길을 막기도 합니다. 고정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 아닌 길을 매번 찾아서 다녀야 하는 험난한 곳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았다”는 의미로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 길 아닌 길을 찾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많은 문제가 새로 생겨나니까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산골에도 한사람이라도 앞서간 오솔길이 나 있으면 그 길이 지속되고 사람들이 계속 다니게 되어 길이 쉬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어제 갔던 길이 오늘은 없고, 아니 금방 왔던 길이 돌아서 가려면 이미 없어지고 진창이 되어 있으면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새 길을 만들어 가며 다니는 것이 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라굼을 다녀간 동생이 나에게 말 타는 요령을 알려준 것은 딱 두 마디입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내리막에서는 몸을 최대한 뒤로 젖히라”고,
그것이 난생처음 말을 타는 사람이 받은 유일한 안내이고 교육입니다. 난 겁이 많고 모험이나 재미를 좋아하는 체질도 아니라서 가족들과 놀이동산에 가도 회전목마도 못타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 등에 올라탄 것은 아주 대단한 모험입니다.

동생이 나를 할머니라고 소개한 덕택에 가장 오래되고 노련한 말잡이 노인이 나를 말에 태워주었습니다. 키를 훌쩍 넘기는 옥수수 밭 고랑사이의 길을 가다가 자갈밭을 지나고 갈대밭도 지나고 물길을 건너도록 말잡이 노인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말과 똑같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말잡이 노인도 60세는 넘어 보입니다. 말이나 말잡이나 살집이라곤 없이 바짝 마른 모습이라 내가 그들을 돌봐주어야 할 것 같은 풍경입니다. 몇 십 년 말잡이를 한 할아버지는 그 흔한 조리 신발도 신지 않아서 내가 자꾸 걱정을 했더니 동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발을 신으면 진창에 발이 빠졌을 때 무게 때문에 다리가 잘 빠지지 않고, 돌밭이나 도랑이나 흙길을 갈 때 마다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해야 하는데, 두 시간을 가는 동안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단련된 맨발로 걷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말잡이의 발바닥이 말발굽처럼 두꺼워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까만 발에 하얀 덧버선을 신은 듯 발바닥만 유난히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신발은 신지 않았지만 바지는 입고 있었는데 바지가 물에 젖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입니다. 건너야할 강이 나오자 한손에 말고삐를 잡은 채로 내가 보고 있는데도 바지를 훌렁 벗었습니다. 다행히 팬티는 입고 있더군요. ^^ 그분이 할아버지라서 그러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할머니라 여자로 보이지 않아 무시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인 듯 했습니다. 말 위에서 앙상한 할아버지가 바지를 벗는 모습을 나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자라거나 내가 여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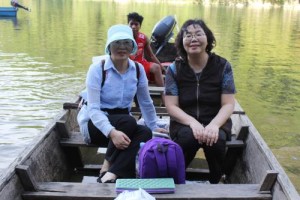
말의 배쯤에 내 발이 놓여 있었는데 발이 젖을 정도의 물이 흐르는 강을 건너면서, 물이 차지는 않았지만 발이 젖어오자, 말이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법 물살이 빠른데 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라,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공포가 마음속에 스멀스멀 일어났습니다. 여행자보험 잘 들어 놓고 왔고, 내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 정리를 하라고 컴퓨터 앞에 내 이메일 비밀번호를 써놓고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말잡이는 물에 젖으면 안 되는 손전등과 바지를 머리위로 치켜들고 한손엔 말고삐를 잡고 어려움 없이 물길을 가는데 말 위에 앉은 나 혼자 괜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잡이는 강을 건너자 물기도 닦지 않고 바지를 꿰더니 다시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강을 건너면 산길이 이어지고, 밭가의 좁은 길로 가다가 옥수수 밭고랑 사이를 갔습니다. 큰 짐승이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에는 옆에서 가던 말잡이가 앞에서 말을 이끌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방 주위가 캄캄해졌습니다.
나는 소뿔처럼 생긴 딱 하나 있는 손잡이를 무슨 생명줄이나 되는 듯 손바닥이 아프도록 잡고 있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길은 계속 되었고, 말을 탄지 한 시간이 넘어가자 엉덩이에 통증이 왔습니다. 가죽 말안장위에 등산 갈 때 산에서 쓰는 에어방석을 하나 덧대어 앉았는데도 너무 아파서 내려서 걷고 싶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동생이 내 사정을 알겠다는 듯 “언니! 양쪽 발에 체중을 싣고 엉덩이를 들고 일어섰다 앉았다 해봐 그러면 훨씬 수월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발에 체중을 싣고 엉덩이를 말에서 떼고 몸을 앞으로 굽혀서 날아갈 듯 빨리 달리던 모습이 떠오르긴 했지만 내가 무슨 애마부인도 아니고 ^^ 처음 타는 말 위에서 그런 기술(?)을 발휘할 능력이 못 되었습니다.
엉덩이가 아픈 중에도 머리위로 쏟아질 듯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쳐다봤습니다. 인공적인 크리스마스 추리 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서쪽하늘에 조그맣게 보이던 금성이 바로 머리위에서 주먹만 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과 오리온좌를 비롯한 수많은 별 들,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았나? 어릴 때 하늘의 별을 바라 본 후,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의 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고 하늘이 맑은 날 멀리 금성 정도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쏟아질 듯 하늘 가득 많은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멀리 떠나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말 위에서 나는 이효석님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과 이순원 선생님의 “말을 찾아서” 생각났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걸은 길이 이런 밤이었을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말에서 내려 땅에 발이 닫자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난 이국의 앙상한 말잡이 노인을 안아서 따뜻한 감사를 담아 허그를 하고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순이
데레사
2016-01-16 at 11:46
뭐든 처음 해보는것은 무섭지요.
경찰에 들어와서 처음 사격을 하던날 얼마나 무섭던지
온 몸이 땀에 젖고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은 귀에서 총소리가
나더라구요.
말을 처음 탔으니 그것도 단 한마디의 교육만 받고 탔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가 상상이 됩니다.
더구나 어둡기 까지 했으니…
이제 위블이 좀 활성화 되는것 같아요.
벤자민
2016-01-17 at 06:01
좋은 경험 하시네요
일반 사람들은 돈 주고 가보기 힘든 곳으로 가셨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참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같죠
저 말 타는 보니 말의 크기도 그렇고 또 마부?가 잡아주니
그런데 저거 참 위험하다고 해요
여긴 자연이 좋다보니 돈 주고 말 타는 곳이 더러 있는데
사고가 많아 나지요 여기도 누가 말 타다 떨어져 지금 사경을 헤메고 있지요
말이 성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타는 사람 알아 본다지요
굳이 슈퍼맨 언급치 않더라도 아차 하면 사고 난다고..
아무튼 좋은 경험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