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호수의 물고기들 중에서 어떤 놈은 내가 물가로 다가가면 나에게로 와서 꼬리 치는데, 아 저 사람 또 왔구나, 하면서 나를 알아보고 오는 그놈이라고 나는 믿는다. 연꽃의 흰 꽃잎에는 새벽빛 같은 푸른 기운이 서려 있어서 말을 걸기가 어려웠다. 연꽃은 반쯤 벌어진 봉우리의 안쪽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거기는 너무 순수하고 은밀해서 시선을 들이대기가 민망했다. 넓은 호수에서 연꽃들은 창세기의 등불처럼 피어 있었다.
– 작가 김훈 여름 편지 중

1편의 ‘약속’대로 연꽃 만나러 간 어제 산책나온 유치원생들이 한바탕 웃으며 지나가고…젊은 커플도 셀카봉을 휘두르고 있어서 조용히 작가 김훈의 글을 떠올리기는 좀 그랬다. 서울숲 USA 변하기 전 무명지에서면 또 모를까…호수 대신 연못, 홍련 백련이 아니고 수련이어서? 하여 조용한 새벽에 한 번 와 보기로 했다.

그래도 낯익은 거북이가 입을 벙긋거리며
계속 나랑 눈 맞출 때는 이 단락이 금방 떠올라
싱긋했는데 젊은 커플도 바로 내 곁에서
“오모 제 봐… 먹이달라는 거아냐”
이러며 신기해했다.

어젠 1편 잡글 올리다 최가 커피 내부까지 마자 올리고 가느라
한강변으로 걸어가기는 늦어버려 할 수 없이 셔틀버스를 타고 수영장에 도착했다.
빨아 널어 논 수영복을 또 안가지고 온 걸 알게된 건 샤워실에서였다.
수경이 가방 위로 비죽 보이길래 수영복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먼저 들어가는 같은 레인 회원들께 구차한 설명 또 하기도 챙피해서
천천히 샤워만 하고 락커룸으로 나와버렸다.
‘아… 연꽃 보러가라는 뜻이구나’
오랜만에 연못쪽 산책하는 것도 좋지뭐…
그니까 평소랑은 다르게 반대로 돌아다닌거다.

모든 생명은 본래 스스로 아름답고 스스로 가득 차며 스스로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어서 여름 호수에 연꽃이 피는 사태는 언어로서 범접할 수 없었다. 일산호수공원의 꽃들은 언어도단의 세계에서 피어났고 여름 나무들은 이제 막 태어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빛났다. 나무들은 땅에 박혀 있어도 땅에 속박되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 속에도 저러한 아름다움이 살아 있다는 것을 연꽃을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이 자명했고, 이미 증명되어 있었다. 내 옆의 노부부는 나무 그림자가 길어지고 빛이 엷어질 때까지 말없이 연꽃을 들여다보았다. 늙은 부부는 연꽃을 통역사로 삼아서 말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후략…) 작가 김훈 여름 편지 중

일본 목련 노랑꽃은 늦게까지 피어있고
산딸나무도 열매를 달고 도도하게 하늘을 향해 매달려 있었다.
사방천지 원추리는 이미 지는 추세…
멀리서 보면 노란꽃같은 잎을 매단 키작은 애는 이름이 뭘까…
캠핑 단지엔 텐트들도 많이 보이고
중국집 메뉴 고르는 풍경도 정겨워보였다.

언제 선선한 날 골라 현지니도 데려와 거북이도 수박도
조롱조롱 매달린 영주사과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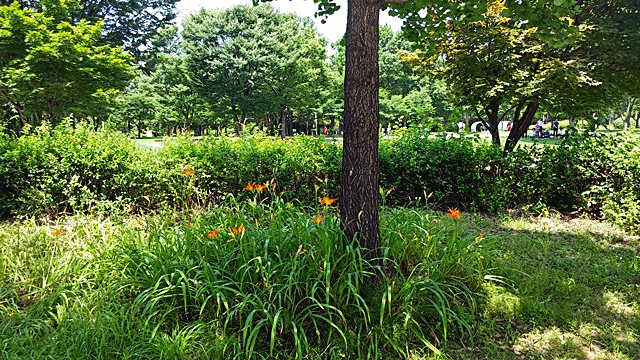

한련화를 좋아한 이유는 혹 연잎닮은 잎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곧바로
고대박물관 실실 걸어가 백순실화백
1:1로 만나 많은 이야기 나눈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