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게을리 했다. 아니, 거의 하지 않았다. 학교는 남 다닐만큼 다녔다. 그저 밥은 먹고사는 집 형편이라 비슷한 처지의 남의 집 아이들 하듯, 학교는 그런대로 다녔다. 원래 공부의 의미는 좋고 순수하다. 학문을 익혀 지식을 쌓고, 생각을 바로 잡아 뜻을 넓혀가는 修身과 齊家, 더 나아가서는 經世의 한 방편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런 순수함의 공부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를테면 스펙의 일종으로, 많이 쌓으면 세상을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살아가던가, 아니면 또 이를 위한 처신의 일환으로 하는 공들여 행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이런 데 별 의욕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공부 또한 할 생심이 그다지 생기지 않는다. 내 경우가 그랬다고나 할까.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까지는 그냥 쉬웠다. 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지금에사 가늠해보면 후자 쪽이지만, 그 때는 남들 하는 정도는 했는가 보다. 그러니 별 무리없이 남들 가는 만큼 고등학교까지는 잘 갔다. 문제는 대학부터였다. 거기까지 공부를 소홀히 한 머리 하나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특히 수학이 그랬다. 고등학교 땐 아예 수학시간엔 미술반 같은데 가서 놀았다. 그러다 대학입시와 마주치게 되니 어쩔 것인가. 수학을 치르지 않는 학교를 가야했다. 대학에 들어가고서는 더 했다. 공부와는 담을 쌓았다. 다가올 장래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질 않고 놀았다. 아예 학교를 가지 않았다. 학교는 흑석동인데 하숙은 명륜동 성균관대 근처 명륜시장 부근에서 할 정도였으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집안이 기울면서 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어디 취직이라도 하려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태어나 처음으로 해본 것도 그 무렵이다. 졸업도 문제였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 졸업이 될 리가 없다. 섬머니 윈터 스쿨을 번갈아하면서 겨우 규정학점은 메웠다. 그러나 장애가 또 있었다. 70 학번부터 적용된 졸업논문제다. 논문이 통과돼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어떤 제도이건 첫 시작은 시범적인 것이다.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꼼짝없이 그 관문은 무조건 거쳐야하는 것이었다.
뭘 써야 하나. 전공과목을 주제로 해야 하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 전공과목에 익숙해 있을리 없다. 한 이틀을 끙끙댄 끝에 나름 내긴 결론은 이렇다. 기왕 쓰는 것, 어려운 논문을 쓰자. 심의교수들 조차 헷갈리게 하는 어려운 논문을 쓰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면 뭘 쓸까. 그 무렵 어떤 책에서 의미심장한 한 단어를 본 게 떠올랐다. ‘시맨틱스(Semantics)’라는 것. 우리말로는 ‘의미론’으로 드문드문 알려질 때다. 언어학의 일종인데, 언어의 의미에 관하여, 그 기원. 변화. 발전 등을 연구하는 한 이론이라고 했다. 이 걸 매스컴 이론에 적용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제를 일단 만들었다. ‘신문 사회면 기사의 의미론적 분석과 연구.’ 그럴듯하지 않은가. 솔직히 나는 그 때 심의교수들의 수준을 좀 무시했다. 서울 장안의 인기 영어 학원 강사도 심의교수 중의 한 명이었다. 이 정도의 논제라면 그들도 모를 것이다. 모르면 그냥 눈 감고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나 일은 쉽지 않았다. 우선 ‘의미론’이라는 게 그 무렵 대두 된 연구영역이라, 그에 관한 국내 자료가 전무했다. 도서관 몇 곳을 뒤졌다. 외국자료도 없었다. 일단 그 뜻을 알기위해 ‘대영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ica)’을 뒤졌다. 거기에 신조어로 두어 페이지 남짓하게 게재되고 있었다. 그게 통 털어 유일한 자료였다. 그나마 영어사전을 뒤져가며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그게 뭔지 감이 오지 않았다. 지금도 ‘의미론’은 그 연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연구 분야다. 그것을 40년도 더 전에 턱하니 논제로 잡았으니, 지금 생각해봐도 간이 배 밖에 나올 정도로 호기를 부렸던 것 같다. 결국 내 풀에 겨워 포기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생각을 바꿨다. 어려운 논제 대신 좀 특이하고 희귀한 걸로 하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 북한이 떠올랐다. 북한의 언론을 주제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퍼뜩 든 것이다. 당시의 국토통일원 자료실에 가서 관련 논문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확할런 지는 모르겠으나, 박사학위 논문 한 편 빼놓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로서는 기회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당시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 언론에 관한 국내적 관심이 어째 이 정도 수준으로 저조한가가 신기해 보였다. 논문 통과는 따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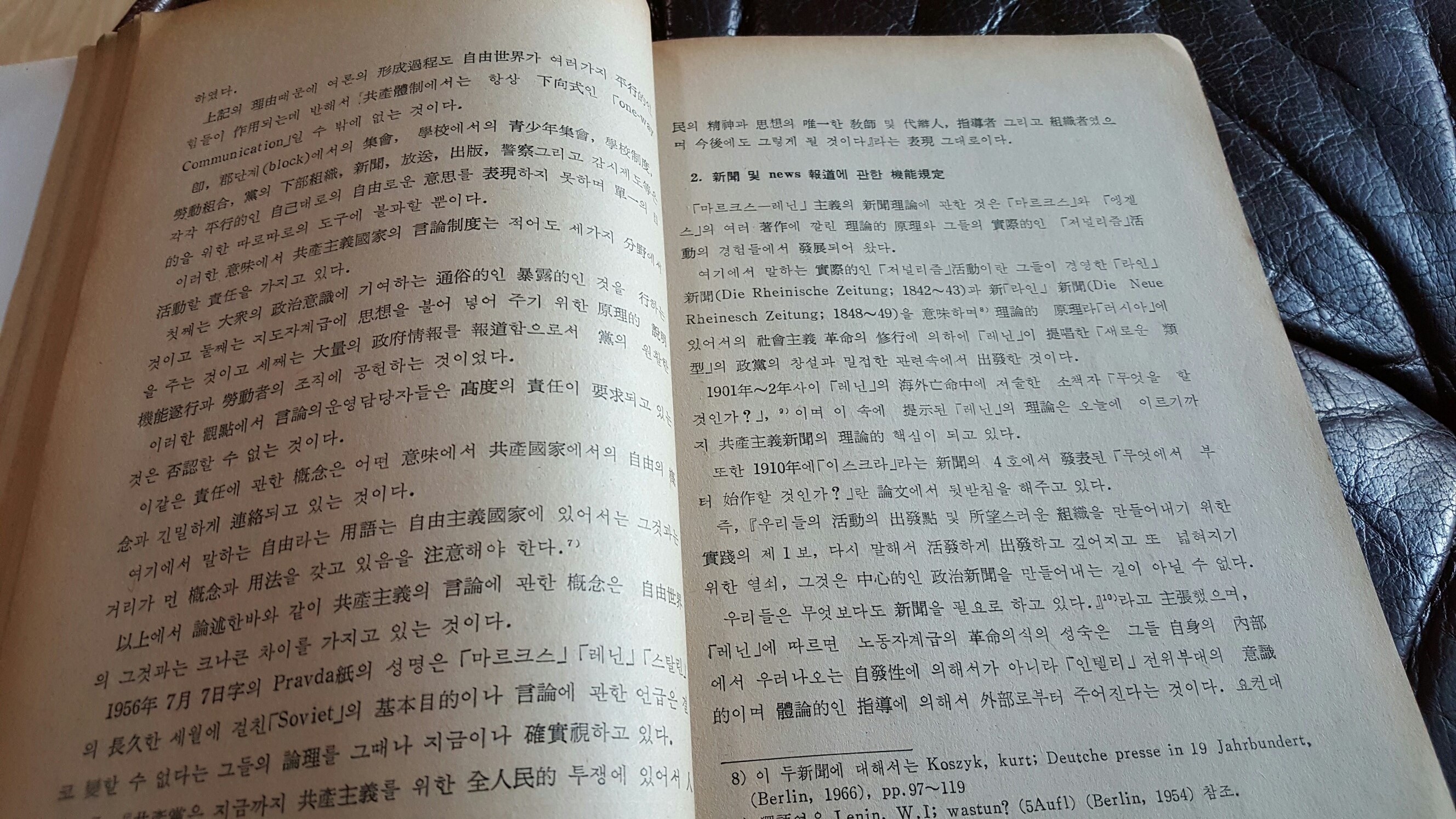
딱 한 달 만에 끝냈다. 논문작성 과정을 일일이 소개하기는 민망하다. 거의 베끼기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언론에 관한 이론은 일본 책을 인용했고, 자료나 도표는 국토통일원과 미 공보원 신세를 졌다. 내 머리에서 독창적으로 분석해 제시한 이론은 없다. 하지만 써놓고 보니 그럴 듯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졸업논문이다. 이름 하여 ‘북한의 언론정책 및 그 구조적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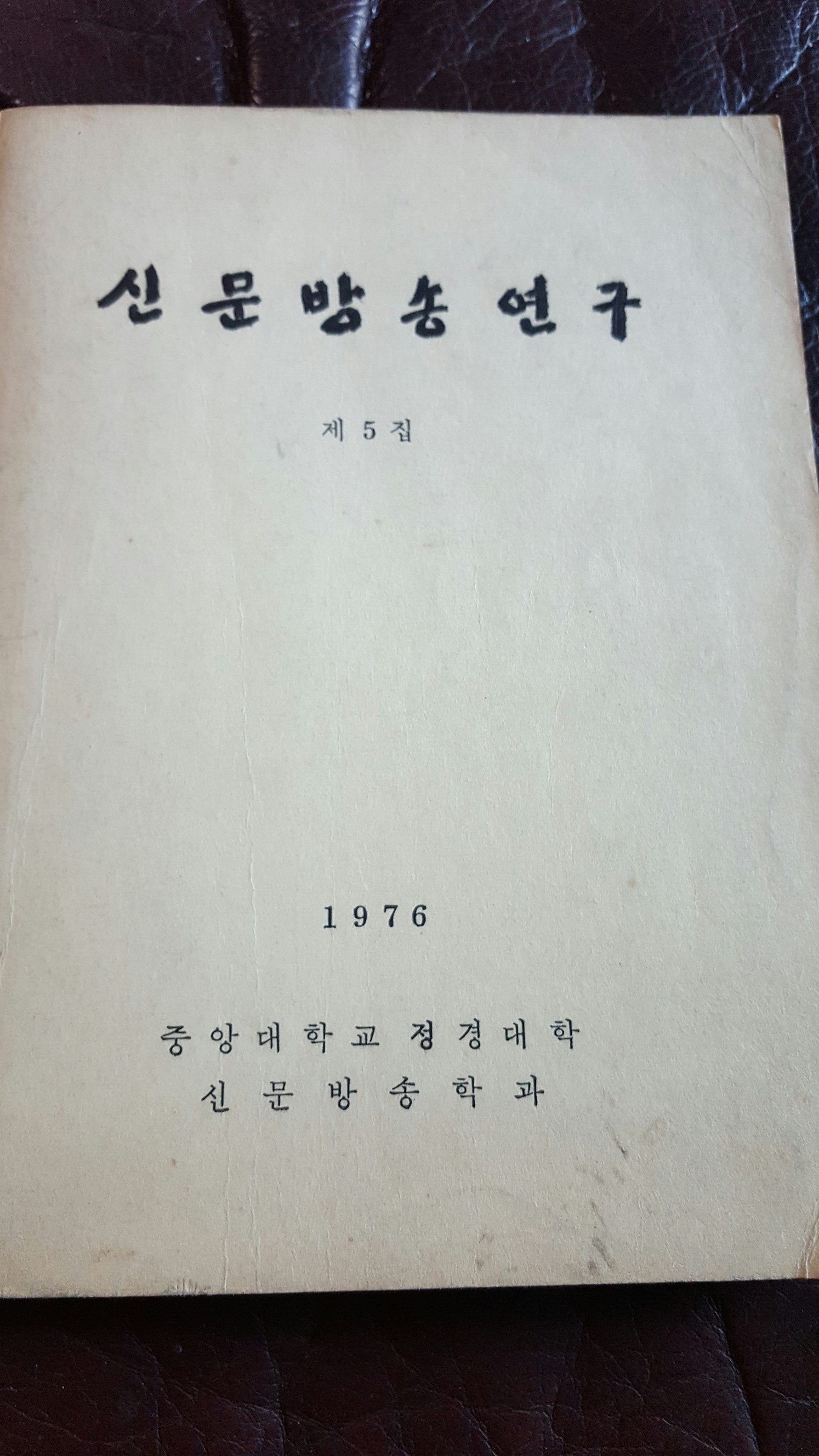
예상했던대로 별 무리없이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교수들이 북한을, 그것도 북한의 언론을 알리가 없을 것이라는 그 예상이다. 심사 발표장에서는 칭찬까지 받았다. 이래도 되는가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정말 그랬다. 나의 논문은 그 해 말 신문방송학과 논문집에 게재됐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학문을 모독하는 짓이라는 참담한 생각까지 들었다.
공부도 요령이라는 말이 있다. 공부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한 방법일 것이다. 공부에 ‘왕도’는 아닐지언정 공부의 목적이 순수하고 좋으면 그리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나의 유일한 이 논문은 요령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오늘 어쩌다 책장에서 눈에 띈, 이 논문이 게재된 논문집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회라는 말이 얼토당토않은 것이겠지만, 염치없게도 그 쪽으로 생각이 간다. 결국 가당찮은 짓이겠지만 참다운 공부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 나이에 그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루에 글 한 자를 읽더라도 그 속에 담긴 참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여 실천해 나가는 그런 깊이 있는 공부를 해 보고 싶다. 그 전에 매사를 바로 보고 바로 헤아릴 줄 아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다. 나만 그러면 뭐 하냐. 공부 또한 나를 받아 들여야만 할 것이다. 이 부끄러운 논문을 책상머리에 걸어놓고 매일 대하면서 마음을 다져나가면 받아들여질까. 반에 반, 아니 또 그 반에 반만이라도 공부가 나를 받아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