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작은 추석날의 아침 첫 일정을 영화관람으로 잡았다.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아내 음식 장만하는데 도움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다, 아내 또한 떠밀었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마침 보고잡은 영화가 있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다. 이 영화와 관련해서는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다. 김훈의 ‘남한산성’을 읽은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동명의 영화가 마침 나왔고, 이 영화를 두고 김훈이 만족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에 얽힌 스토리는 모두들 잘 알고있는 내용이고, 물론 그래서 김훈이 이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처리한 게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영화 또한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을까가 나름의 관심사였다.
김훈의 남한산성에 관한 소설적 작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락별 스토리를 통해 남한산성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소설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영화 시작부터 좀 시큰둥한 느낌이 든 것은 사실이다. 김훈은 이런 식의 작법을 잘 구사하고 있는데, 스토리 전개라든가 문장 등이 모두 다 좋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단락들로 연결되어 도출되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나름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그의 최근작인 ‘공터에서’를 읽은 후 느껴진 것이라 그런 기분이 더 했다. 물론 ‘남한산성’은 ‘칼의 노래’와 같은 반열의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소설이라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아무튼 영화 시작에서 그런 느낌이 든 것은 사실이다.
영화는 영화가 시작되면서 갖는 느낌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시큰둥하게 느껴지면 그런 느낌으로 이어진다. ‘남한산성’도 그랬다. 물론 소설을 먼저 보았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잘 알려진 내용에다, 그 전개까지 소설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에 그랬다는 얘기다. 영화와 소설은 다르다. 영화적인 작법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영화 ‘남한산성’은 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일까,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시계도 몇 차례 보았다. 결국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애매했다.
하나 관심을 끈 것은 대장장이로, 김상헌의 밀명을 받들어 행동하는 ‘서날쇠(서生金)’에 관한 처리 부분이다. 김훈이 서날쇠를 소설에 끼워넣은 것은 소설적인 재미를 위한 김훈 그 나름의 뛰어난 발상이 아닌가 싶다. 이런 발상은 신동엽이 동학혁명을 주제로 한 그의 대하서사시인 ‘금강’에 ‘신하늬’라는 익명의 인물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을 연상케한다. 김훈은 남한산성을 둘러싼 역사기록의 한 귀퉁이에 실제 조그맣게 언급되고 있는 ‘서흔남’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후기에 밝히면서 독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데, 둘을 같은 인물로 연결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영화적인 작법을 찾자면 ‘서날쇠’에 관한 부분이고, 이게 영화의 재미를 더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척화의 주역인 김상헌을 ‘서날쇠’에 연결시키고, 서날쇠에 맡긴 역할의 실패로 자결에 이르게한 대목은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너무 견강부회한 느낌을 준다.
영화를 너무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필요는 없다. ‘남한산성,’ 이 영화도 그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
사족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글귀가 머리 속을 맴돌았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있던 47일간의 인조실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다(上在南漢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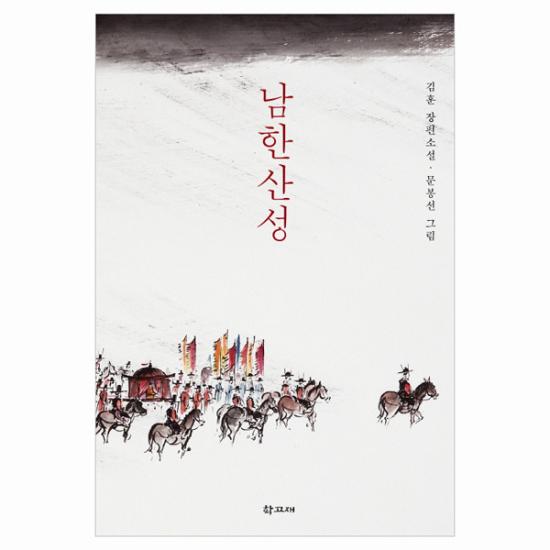
데레사
2017년 10월 4일 at 3:33 오후
김훈의 소설로 읽었습니다.
영화는 못 보았는데 지금 상영중인가 봐요.
영화는 그저 영화일뿐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군함도를 보고 원작과 많이 틀리다고
실망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나저나 추석 잘 지내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