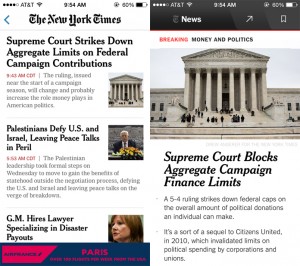앞으로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이 잊힐[지워질] 권리의 행사 여부는 구글이 결정한다?
지난주 구글은 가디언과 BBC 방송, 데일리 메일 등 영국 매체들에게 특정 기사들은 영국 네티즌들이 구글 검색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유럽연합(EU)내 최고재판소 격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5월 13일 한 스페인 남자가 제기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정보가 구글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들의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유럽연합에선 ‘정보 콘트롤 기관(data controller)’이 보관 중인 데이터가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관련이 없거나(irrelevant) 너무 낡은 정보이거나(out of date) 부정확하거나(inaccurate), 사적 영역을 침범(invasion of privacy)해선 안 된다는 정보 보호 지침이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이 바로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정보 콘트롤 기관’이라고 인정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CJ에 청원을 한 사람은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야 곤잘레스. 16년전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물들을 경매에 붙였다. 이 뉴스는 한 신문에서 뉴스로 다뤘고, 온라인에도 게재됐다. 하지만 이는 1998년의 일이고 곤잘레스는 이제 이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16년 전의 일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다.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자신이 겪은 재정난이 드러났고 이는 그의 비즈니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애초 유럽연합이 이 사건을 심리했을 때에, 구글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적극적으로 이 잊힐 권리를 옹호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당연히 자사 콘텐츠가 구글 검색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은 언론사와 칼럼니스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구글에서 검색만 안 될뿐이지, 그 해당 기사가 언론사의 디지털 아카이브나 언론사 웹사이트의 검색창에서조차 삭제되거나 검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온라인 검색의 90% 이상이 구글 검색을 통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 검색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과 관련된 안 좋은 기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은 왜 그랬을까. 미 언론비평가 매튜 잉그럼(Mathew Ingram)은 “이 판결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실수’라는 점을 분명히 부각시키려고 비록 서툰 방식이긴 했지만, 일부러 언론사의 반발 등 공론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지난 3일 구글은 영국 축구 심판이 과거에 페널티킥 선언을 번복한 것을 놓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기사를 애초 검색에서 나오지 않게 했다가, 이 기사를 쓴 일간지 가디언의 반발에 다시 검색 링크를 허용했다. 하지만 미 금융위기때 미 거대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CEO E. 스탠리 오닐이 막대한 경영 손실을 겪고 축출된 과정을 취재한 BBC의 기사에 대해선 검색 제외 결정을 유지했다. BBC 기자는 왜 내 글을 망각으로 처넣느냐고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구글의 이러한 ‘검색 제외’ 결정 통보를 받은 영국 언론사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공표하며 문제를 제기해, 인터넷에서 조용히 ‘잊히기를’ 원했던 사람들로선 오히려 더 유명세를 타는 반작용도 일었다. 메일 온라인의 발행인 마틴 클라크는 AP 통신에 “검색 링크 제외 조치는 도서관에 가서 좋아하지 않는 책을 불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어쨌든 구글의 이번 조치로, 유럽에선 사람 이름으로 구글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밑에 “유럽의 정보보호법에 따라 몇몇 검색 결과는 제거됐다”는 안내 문구가 뜬다. 물론 ECJ의 결정은 유럽에서만 적용된다.
지난주말까지 구글에게 접수된 ‘검색 제외’ 요청 건수는 모두 7만건. 이와 관련된 웹페이지만도 27만6000 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누가 ‘검색 제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느냐는 것이다. 법원이나 언론사가 아니다.
바로 구글이 자사 돈으로 채용한 법무사들(정식 변호사도 아니다!)이 결정한다. 즉 7만 건에 달하는 ‘구글 검색 링크에서 지워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구글이 고용한 이 법무사들(paralegals)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ECJ의 결정이 있고 나서 처음 며칠은 하루 1만여건의 ‘검색 제외’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하루 1000건 정도 달한다. 그러나 과연 이들 법무사들이 이 모든 신청인이 첨부한 웹페이지를 일일이 따져서 사실 여부, 맞지 않는 낡은 자료, 무관한 데이터,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별해 검색 제외를 결정할 수 있을까.
결국 구글은 외견상 언론사에 ‘고압적’이고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 이 문제의 재공론화를 꾀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