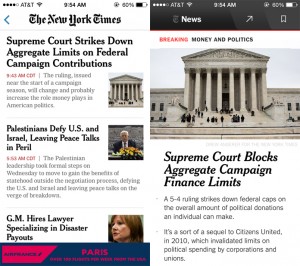2011년 3월 콘텐츠 유료화를 시작한 이래, 뉴욕타임스(NYT)는 전 세계 신문사들의 주목거리였다. 물론 그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유료화를 했다. 그러나 이 두 신문은 ‘경제 뉴스’로 보다 특화됐다는 점에서, 고(高)품격 general news를 생산하는 뉴욕타임스가 인터넷 시대를 헤쳐 나가는 기업 전략은 그 콘텐츠의 압도적인 질(質)과 함께, 전 세계 신문업계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년여간 말 그대로 0(제로)에서 80만명에 이르는 디지털 콘텐츠 유료구독자를 이끌어냈다. ‘콘텐츠는 공짜’ ‘유통(플랫폼)이 왕’이라는 인터넷 시대에 이룬 쾌거였다.
그런데 최근 나온 2분기 실적은 앞으로 갈 길에 큰 그림자를 드리운다.

■ 2분기 실적
1분기까지 NYT가 거둔 디지털 유료구독자 수는 80만 명이었다. 모바일 앱/웹/PC 등의 기기별 구독 결합상품 구성에 따라 15~35달러인 구독료를 내는 디지털 독자들이었다.
2분기 들어서 NYT는 월8달러짜리 ‘쪼개기 상품’들을 많이 내놨다. 즉 NYT NOW, NYT Opinion, NYT Cooking과 같이 방대한 콘텐츠의 NYT를 ‘쪼개서’ 보다 많은 구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미 미디어업계에선 ‘같은 고기를 얼마나 잘게 썰어서 팔 수 있을까’라는 조롱도 있었지만, 벌크(bulk)로 일단 상품을 내놓은 회사로선 추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벌크 상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쪼개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결국 2분기에 실제로 늘어난 유료 구독자 수는 약3만2000명에 불과했다. 6월말까지 총 디지털 유료구독자 수는 83만1000명.
NYT는 2분기 증가 구독자 3만2000명의 어느 정도가 기존 상품 구독자(15~35달러)인지, 새로운 쪼개기 앱상품 구독자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한 산수는 가능하다. 3만2000명이 모두 기존상품 구독자라고 해도, 이는 1분기 증가분 3만6000명에 못 미친다. 즉, NYT의 디지털 유료화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만약 월8달러짜리 신상품 쪼개기 앱 구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더 심각하다. 정기구독자(월15~35달러)의 증가는 이제 멈췄고,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했던 ‘쪼개기 앱’들은 추가 독자 유치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이들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1년간 쏟은 개발비와 앱 콘텐츠 구성을 위한 인력 운용을 생각하면, 완전히 마이너스다. NYT NOW 앱 하나를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20명 가까이 된다).
■ 매킨지가 추정한 NYT의 유료독자수 전망
4년 전에 NYT 경영진은 컨설팅 회사 매킨지에 ‘디지털 유료 독자’수에 대한 추정을 의뢰했다. 유료화 장벽(paywall)을 세우기 전 얘기다.
당시 매킨지의 추정은 월 15~3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낙관적인 숫자는 80만~90만 명이었다. 어쨌든 100만 명은 안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추정이 맞는다면, 현재 NYT의 디지털 유료독자수는 이제 한계점에 이른 것이다.

■ NYT의 디지털 매출
이런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NYT가 보잘 것 없었던 디지털 매출(디지털 콘텐츠 유료 구독 +디지털 광고 매출)을 연간 3억6000만 달러 규모(2014년 예상)로 키운 것은 놀라운 일이고, 한국 언론사들로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중 디지털 구독료가 1억5000만 달러, 디지털 광고 매출이 2억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의 ‘위대함’은 비슷한 웹트래픽을 유지하면서 웹 콘텐츠는 완전 공짜, 디지털 광고 수익 위주의 경영을 고집하고 있는 영국의 가디언과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가디언은 한해 디지털 광고로 6200만 달러를 거두는데 그쳤다. 그래서 가디언의 작년 전체 디지털 매출은 8500만 달러였지만, 적자는 4700만 달러에 달했다.
가디언은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스캇 트러스트(Scott Trust)가 있어서 다행이지, 가디언의 디지털 전략에 대한 온갖 ‘찬사’는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 ‘절망적’이다. 그러나 스캇 트러스트 재정적 지원으로 가디언은 앞으로 19년간 지금의 적자 규모를 유지해도 계속 신문과 인터넷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 NYT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NYT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디지털 성과에도 불구하고, NYT의 디지털 사업 규모는 결국 3억6000만 달러짜리라는 것이다. 이 숫자로는 NYT가 1100명에 달하는 편집국 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퀼리티 뉴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NYT의 디지털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에 불과하다. 즉, NYT가 이 정도의 디지털 매출로서 유지할 수 있는 digital-only 언론사의 편집국 규모는 200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큰 신문사들 편집국 규모와 비슷하다.
물론 BBC 사장을 역임했던 NYT의 CEO 마크 톰슨은 여전히 투자가들에게 자신감을 보인다. “높은 숫자의 백만 명대 숫자를 미국에서 유료 독자로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터무니없지 않다(It’s not ridiculous to think of a high single million number in the U.S. as an addressable market.)” 즉, 700만~900만 명대의 유료독자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 숫자에서 너무나도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