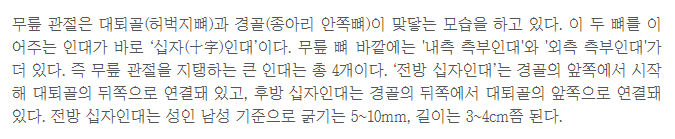영어권 뉴스 웹사이트에서도 ‘낚시성(性)’ 기사 제목이 있다. 물론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클릭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도 clickbait이다.
그런데 유형은 우리랑은 좀 다르다. 우리는 ‘허걱’ ‘충격’ ‘알고 보니…’ 등 독자의 기대를 쥐어짜는 표현을 쓴 고전적 수법에서부터, 아예 내용과는 무관하게(또는 읽고 나면 애초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져 허무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제목을 다는 수법이 많다.
“섹시 女배우 ‘깜짝발언‘ “연기 전에 반드시…“—>결론부터 얘기하면, 깜짝 발언도 아니고, 연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섹시 여배우는 한국 사람도 아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여배우 메건 폭스가 그냥 한국 음식점 가면 고추장, 김치 좋아한다는 얘기다.
영어권, 특히 미국의 인터넷 뉴스매체들, 버즈피드(Buzzfeed), 업워디(Upworthy)이 즐겨 쓰는 ‘낚시성 제목’은 종종 길다.
“자기애가 그다지 인기 있는 아이가 아닌 줄은 알았지만, 부모 눈앞에서 바로 일어난 일을 봤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Their Son Wasn’t A Popular Kid. Imagine Their Surprise When This Happened Right Before Their Eyes)”
===>제목만 보면, 부모 눈앞에서 왕따, 괴롭힘을 당하는 자식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다. 중학교 풋볼 팀 친구들이 풋볼 재주가 영 없는 왜소한 체격의 아들이 터치다운을 할 수 있게 함께 도와줬다는 훈훈한 얘기다.
“당신이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질병은 ‘아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 애가 아니고 남의 애를요(A Disease You’ve Probably Never Heard Of Is Killing Kids. Not Your Kids. But Someone Else’s Kids.”
===>이 무슨 섬뜩한 범죄인가 궁금하겠지만, 읽어보면 유니세프가 내건 아프리카의 ‘모자 파상풍’을 근절하자는 캠페인 기사의 제목이다.
“어른들도 그렇게 틀리는데, 한 어린 애가 그렇게 옳을 수 있다니!(It’s Weird That A Kid Could Be So Right About Something That Adults Still Get So, So Wrong)”===>(이것까지 속기 싫어서, 아예 클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흔한 ‘당신이 몰랐던~~’, ‘여름에 꼭 가봐야 할 ~~~’ ‘~라면 꼭 알아야 할~’ 10곳, 5가지 등의 리스트 제목들이다.
영어권 매체에서 난무하는 이런 제목들이 전달하는 콘텐츠가 다 허무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제목은 어떡해서든 클릭으로 이끌어내려는 ‘낚시성’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25일 이런 ‘낚시성 제목 clickbait’에 대해선 노출을 금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clickbait의 정의(定義)까지 내렸다.
“사람들로 하여금 클릭해서 더 많이 보고(읽고) 싶게 제목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뭘 보게 될지에 대해선 별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콘텐츠(content in which a publisher posts a link with a headline that encourages people to click to see more, without telling them much information about what they will see).”
몇가지 예시까지 했다. 예를 들어, “어느 두 스타가 개싸움을 했는지 정말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세요”처럼, 느낌표가 팍팍 찍힌 “결코 믿지 못할 ~~~”류의 제목들이다.
페이스북 측은 구체적인 ‘낚시성 제목’ 식별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1. 사람들이 그 기사(콘텐츠)를 얼마나 오랫동안 읽는가. 만약 낚시성 제목이었다면, 그 콘텐츠가 게재된 웹사이트에서 곧바로 페이스북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는 독자가 기대했던 것을 읽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람들이 클릭한 숫자 대비 그 콘텐츠에 대한 공유, ‘좋아요’ 표시 숫자의 비율. 즉 클릭은 많이 일어났는데 좋아요, 공유 표시가 매우 적다면 이는 콘텐츠가 형편없고 클릭은 단지 낚시성 제목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페이스북은 이 기준에 따라서, 낚시성 제목으로 포장된 콘텐츠들의 노출을 억제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사람들이 오래 보기만(읽기만) 한다면, 퀄리티가 저질이라도 ‘낚시성’이라는 이유로 퇴출될 우려는 없다.
페이스북이 계속 강조해온 가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만족도 극대화이다. 따라서 낚시성 제목으로 이용자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 기준은 ‘시간’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페이스북과 같은 극소수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역할이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자사의 뉴스피드 벽(壁)에 게재되는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읽는 시간’으로 정하는 순간, 많은 뉴스 미디어사들은 이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특정한 편집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언론사도 아니고, 또 언론사이기를 표방한 적도 없다. 또 어떤 콘텐츠가 가장 많은 이들의 뉴스피드에 게재되는지 그 알고리즘을 정확히 밝힌 적도 없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낚시성 제목은 걸러내겠다는 것을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도, 결국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뉴스(콘텐츠)는 자사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뉴스스탠드’라는 판을 통해 인터넷 언론사들이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게 하는 네이버의 일관된 입장은 낚시성 제목 자제는 언론사의 몫이고, 자신은 장(場)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언론사가 자체 정화(淨化)해야 할 사안에, 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끼어들겠느냐는 것이다. 네이버에 기사가 어떻게 노출돼 유통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광고 수익으로) 사활이 걸린 중소 인터넷 매체들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도 하다. 네이버로선 끼고 싶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뉴스 유통망을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가 뉴스의 질(質)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투명한 알고리즘으로 ‘보여주고 싶은’ 뉴스만을 노출하겠다는 생각만큼이나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