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파스트의 망령들
벨파스트의 망령들
스튜어트 네빌 지음, 이훈 옮김 / 네버모어 / 2020년 7월
연일 비가 내리고 무더운 여름에 읽으면 제격인 장르, 추리 스릴러물이 출판사들마다 연일 출간되고 있다.
영미 문학권의 스릴이야 이미 익숙한 면도 있지만 이번 작품인 ‘파스트의 망령’은 유럽 중에서도 특히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이리쉬란 말이 있듯이 유명 영국 밴드나 가수들을 보면 하나의 킹덤 제국이지만 그 속속들이 파고들면 아일랜드 출신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들의 정서와도 많이 닮은 듯한 그들의 역사, 이 작품에서 보인 배경들은 저자의 감각적인 면이 돋보인 작품이 아닌가 싶다.
제럴드 피건은 전직 IRA(아일랜드 공화국군)의 전설적인 행동 요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든 투쟁은 12년의 복역을 끝으로 출소하면서 사람들에겐 두려움이자 존경의 대상이 된 사람이지만 정작 그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그가 행했던 일들, 그중 12명의 망령들은 그의 주위를 돌아다니며 그를 괴롭히는데, 그들은 모두 그가 죽인 사람들이었다.
그날도 여지없이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건에게 어린 시절부터 친구이자 이제는 정치인이 된, 자신의 손은 깨끗하되 모든 뒤처리들은 피건을 위시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목적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멕케나가 찾아온다.
망령들은 멕케나를 지목하면서 죽일 것을 몸짓으로 나타내고 피건은 그를 죽인다면 물러날 것이냐고 묻는다.
고개를 끄덕이는 망령들-
결국 피건은 그를 죽이게 되고 연이어 과거 그가 지향했던 조국의 통일에 대한 이념에 함께 동참했던 더러운 손을 묻힌 사람들을 계속 지목하는 망령들…
그는 과연 망령들의 명령에 따르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책의 분위기는 누와르를 물씬 풍긴다.
자신을 걷어주고 함께했던 동료들을 죽여야여만 하는 사람, 그런 그를 죽여야 뒤끝이 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정치인들과 그 배후의 사람들, 이중간첩 노릇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행동하는 사람들, 사랑과 배신이 있는 왠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들이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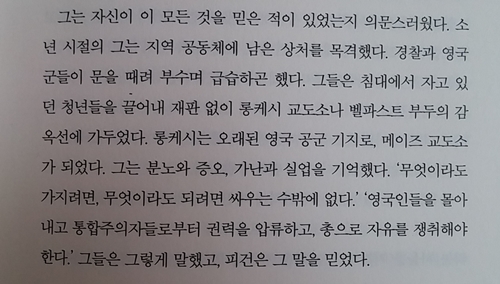
책의 배경인 아일랜드의 남과 북이 갈라진 배경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회한과 후회, 자책, 죄책감이 떠도는 피건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스릴의 표방처럼 느껴진다.
하고 싶진 않았지만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의 맞물림, 그러기에 피건 자신이 망령들에게 마지막 최후 보루였던 ‘자비’를 구한 장면은 화끈한 액션의 추리 장르물이 아닌 한 인간의 반 생애를 통한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선과 악의 양면성을 모두 갖춰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원작 제목이 유령이 아닌 망령이라고 한국 제목으로 지은 것도 바로 이런 뜻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화끈한 스릴보다는 홍콩 누아르적인 색채를 느껴보고 싶은 독자들에겐 어울릴듯한 작품이었다.
뒤를 이은 시리즈가 있다고 하는 만큼 다음 작품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