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 섬 – 장 지글러가 말하는 유럽의 난민 이야기
인간 섬 – 장 지글러가 말하는 유럽의 난민 이야기
장 지글러 지음, 양영란 옮김 / 갈라파고스 / 2020년 10월
한 대의 관광버스가 크로아티아를 출발해 슬로베니아로 넘어가는 경계선에서 잠시 정차한다.
관광객들의 여권을 모두 걷어들인 가이드는 차에서 내리고 한참 동안 버스에 승차하지 않는 동안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고속버스 톨게이트를 연상시킨 그곳에서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창밖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아랍인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톨게이트 기둥 구석구석에 군인들 행렬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고 일부는 그 너머 보이지도 않는 까만 점들로 인식될 만큼 모여 있었다.
여행용 트렁크를 동반한 그들, 그들은 누구일까?
무려 40분~1시간 사이에 관광객들은 내리고 버스 안을 조사하는 군인들(?), 나중에 알고 보니 난민들이 우리들 중 도움을 받아 버스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 검사하는 것이란 말에 뉴스에서 보던 기사가 내 눈을 통해 직접 보게 된 이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다.
5년 전 당시 기억을 되살리게 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떠올린 난민 문제-
여전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들을 우리들은 ‘난민’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탐욕의 시대』, 『빼앗긴 대지의 꿈』을 읽은 독자라면 이 책에서 보인 저자의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양심적인 글과 함께 지금의 유럽 난민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된다.
유럽 난민의 문제는 시간을 거슬러 2003년 이후 이라크 전쟁 이후 계속된 문제였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유럽 국가들에게 닥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저자는 2019년 5월 유럽 인권 이사회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을 방문한다.
유럽의 핫 스폿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다섯 개의 섬들 중(레스보스, 코스, 레로스, 사모스 키오스) 하나인 레스보스, 이름은 아름답지만 난민들에게 있어선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인 곳이자 험난한 곳이다.
그러나 이들이 여기에 도착하기까지에는 어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중산층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일인 이 여정은 2011년 아랍권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난민이 생김과 더불어 본격적인 시리아 내전을 통한 시리아인을 비롯해 쿠르드인, 아프리카인에 이르는 긴 난민의 행렬로 바뀐다.

(다음에서 발췌)
그렇다면 이들은 레스보스 섬에 도착한 이후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난민 인정을 받고 유럽의 희망하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유엔 난민 망명 지원 사무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뒤 레스보스 섬으로 이첩시킨 후 자국의 심사에 따른 결과에 따라 난민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3곳의 기관들은 각기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심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난민들에 대한 처우는 인권이란 문제를 대두시키는 문제로 떠오르게 한다.
푸시 백 작전을 통한 시초부터 망명 신청을 저지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작전은 쇠파이프로 구타하기, 인원 초과의 보트에 있는 난민들 배 주위로 돌면서 난민선 기울기, 포격 가하기, 심지어 고무보트 찢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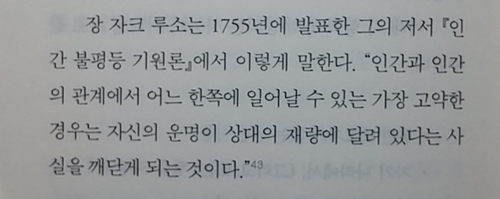
이런 가운데 일단 난민으로 섬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끝 모를 여정은 끝은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긴 시간을 요한다.
입에 먹지도 못할 식량배급,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원 초과, 올리브 숲이라 불린 곳에서 변변치 못한 생활로 버티는 그들에겐 이곳이 사각지대이자 희망의 지대란 점은 두 양면성의 유럽 모습을 보는 듯하게 다가온다.
이런 틈에 무기 로비스트들의 이익을 남기는 장사, 손이 찢어질 정도의 날카로운 철조망 건립, 보이는 즉시 사살할 수 있는 총기 난사 문제는 1948년 제3차 UN 총회에서 발표한 문구를 묻는다.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
유럽의 딜레마는 솅겐 조약과 더블린 조약에 따른 이중의 잣대를 보임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취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교육의 문제까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난민의 문제는 각국의 이익과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게 한다.
 (다음에서 발췌)
(다음에서 발췌)
여기엔 유럽인들이 갖는 종교가 다른 이슬람인들에 대한 생각, 외국인 혐오에 일자리 고용문제와 잠시 거쳐가는 경유지의 유럽을 택한 것이 아닌 정착지로서의 유럽을 택하는 난민들의 문제까지 책 속에 담긴 관계 기관들과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실감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저자는 난민의 기준으로 또 다른 문제인 기근에 관한 난민 규정이 필요함을 말하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수정과 협약을 통한 실천, 난민 신청의 시간 절약과 간소화, 전문인력 보충, 유럽 연합의 그리스 핫 스폿에 대한 지원금의 확실한 사용처에 대한 요구들은 주장한다.
부패온상을 이어지고 있는 핫 스폿-
난민 재배치 거부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주는 지원금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엔 유럽 국가 간의 협약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지금도 계속 자국을 탈출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몸만 나오는 난민들, 바위틈에 숨어 있는 물고기를 찾듯이 난민들을 찾는 사람들과의 신경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기에 다시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나라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유럽은 이 문제를 여전히 유지하고만 있을 것인가를 묻는 저자의 글이 잊히질 않는 책이다.
제목이 ‘인간 섬’인 것은 이들의 고달프고 긴박한 심정을 대변한 듯한 느낌과 함께 인간이 아닌 마치 바다의 기타 생물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있는 난민들을 연상시킨다.
동일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책, “그들의 상처보다 그들의 두 눈을 바라보는 일이 훨씬 힘들다.”는 본문이 잊히질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