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점 일기 – 세상 끝 서점을 비추는 365가지 그림자
숀 비텔 지음, 김마림 옮김 / 여름언덕 / 2021년 1월
어릴 적 동네에 있던 서점에 들르게 되면 항상 계시던 주인아저씨, 아니 사장님은 사탕을 계산 등록기 옆에 두고 오고 가는 손님들의 손이 저절로 쑥 들어가게 하는 마술 아닌 인정이 담긴 마술을 보이곤 하셨다.
당시만 해도 용돈을 모아 곧장 읽고 싶었던 책을 사기 위해 들렀던 곳인데, 이제는 동네에 서점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이 많아졌다.
그나마도 동네책방이란 소신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책을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갑기 그지없고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책을 주문해서 받아 본 경험도 있는 터라 이 책을 접하면서 더욱 동네 책방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성마르고 편협하고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까칠한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저자는 스코틀랜드 한구석의 잊혀진 땅, 위그타운에 자리한 중고 서점 ‘더 북숍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다.
우연찮게 서점을 인수한 후 지금까지 중고 책방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나름대로의 일상의 느낌을 풀어낸, 일기 형식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한다.
흔하디 흔하게 책을 구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추세가 대세인 이 시대에 신작도 아닌 중고 서적을 중심으로 구입하고 되팔고 다시 구입하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사연들은 가슴이 찡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직원인 니키와의 투닥거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골탕(?) 먹이듯이 행동을 취하는 것들에는 빙그레 웃음이 지어진다.
***** (2월 7일 금요일) 노리가 떠나기 전에 니키와 뭔가에 대해 열을 올리며 나누는 대화의 뒷부분을 듣게 되었다. 아마도 진화에 대한 얘기 같았다. 니키는 진화에 관련한 주제로 입씨름하는 걸 즐기는데, 그래서 종종 일부러 『종의 기원』을 소설 코너에 꽂아 놓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나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니키가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소설 쪽에 꽂아 놓는다.- p17
서점에 들르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책을 읽다가 손님을 맞는 것을 본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동안의 짧은 여유라고, 실은 책을 정리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책을 소포로 보내고 전화로 책을 팔 의사를 전해오는 집을 방문해 어깨가 빠지도록 책을 차에 담고 오는 노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책을 통한 타인의 취향을 알게 된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게 된다.
그들이 찾고자 하는 책의 장소나 선택된 책의 종류, 팔려고 내놓는 책을 통한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한 유족의 아픈 마음들을 솔직하게 다룬 부분에서는 일말의 나도 모르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저자가 책과 함께 하는 2월 초부터 시작되던 서점 이야기가 그다음 해 2월 초에 끝 이남으로써 책은 일단락되지만 읽는 동안에는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그곳 서점을 열심히 둘러보고 다녔다.
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자는 말한다.
진정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저 책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다는데, 실례로 쭉 훑어보고 그냥 나가는 사람과 한참을 둘러보고 책을 구매하는 사람 간에는 서점 주인으로서 대해왔던 고객에 대한 어떤 확고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책을 다루는 직업인으로서 겪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현실적이다.
컴이 발달하고 그 컴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은 지금 검색만 하면 툭 하고 나오는 많은 책에 대한 정보도 좋지만 인간 컴퓨터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던 선배들의 직업정신, 책을 둘러보면 어느 때에 출간이 됐고 양장인지 반양장인지, 같은 책이 개정을 거치면서 표지는 어떻게 바뀌었고 초판의 경우엔 어느 때 나왔는지 같은 인간의 지능이 가진 무한대의 정보 습득을 시간과 노하우가 겹쳐지면서 술술 뱉어내는 책 서점인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그런가 하면 아마존이란 거대 공룡이 휘두르는 정책에 의해 소신을 갖고 판매를 하려고 해도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타협(?) 앞에 출판사와 중간 서점,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상생 관계를 다룬 부분들은 도서 정가제에 대한 다른 점들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서점의 바깥 쇼윈도 창이 큰 이유가 책을 진열해 놓았을 때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필요하고 서점이 유독 추운 이유 중 하나도 내부의 공간이 따뜻하면 뿌연 공기로 인해 진열된 책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저자의 서점이 오래된 건물인 점도 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추울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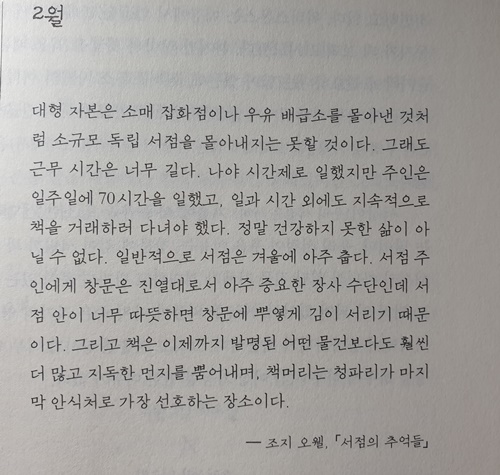
같은 듯하면서도 그 나라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이 다른 부분들을 통한 서점의 풍경을 느껴볼 수 있는 책이라 그 안에 담긴 365일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그가 왜 까칠해질 수밖에(?) 없게 됐는지에 대한 사연이 저절로 이해가 된다.
이렇듯 불평을 늘어놓는 저자가 책을 사랑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 위안이 독자인 나에게도 언젠가는 방문하고 싶다는, 이 책을 들고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노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