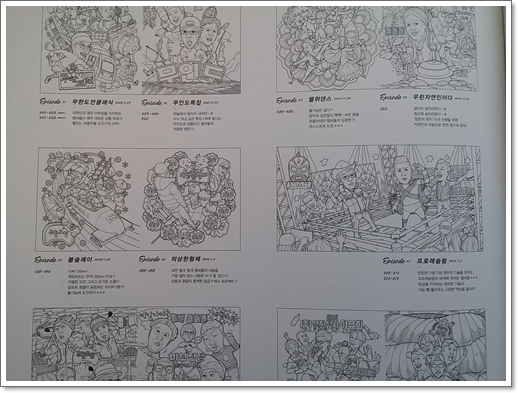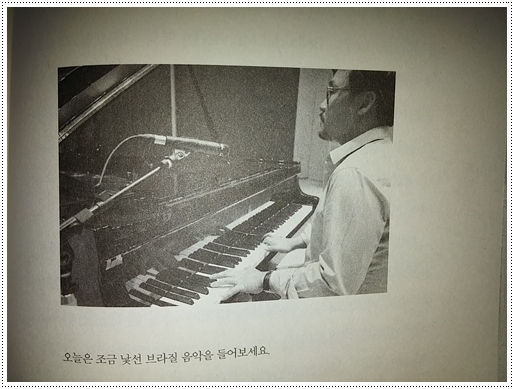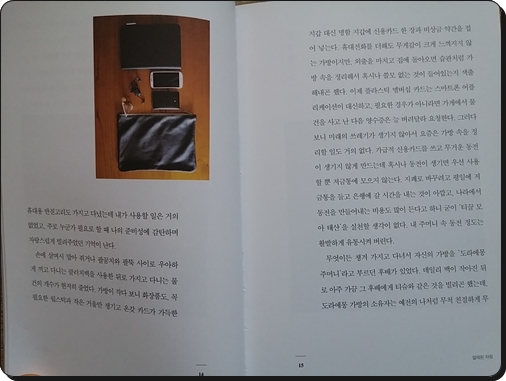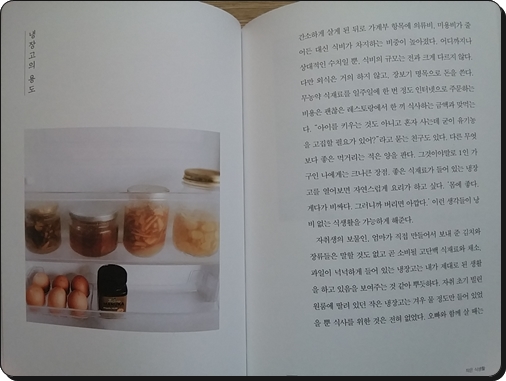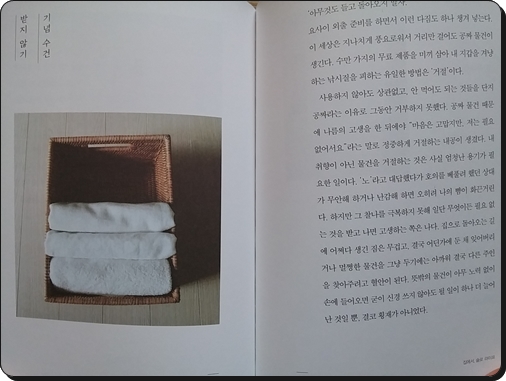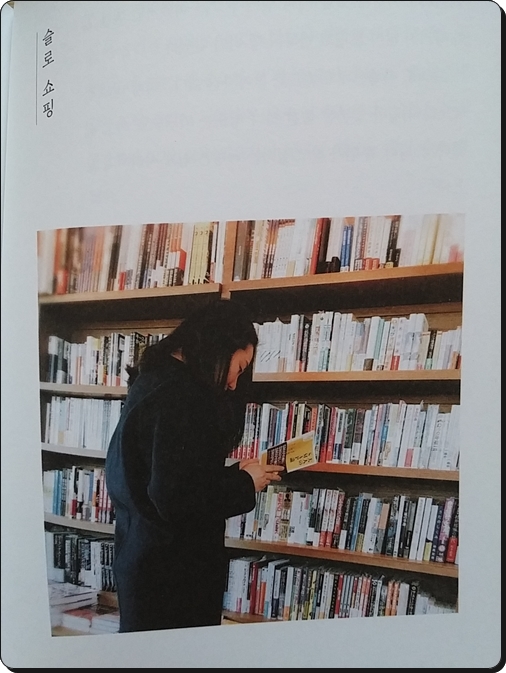그는 한때 천사였다
카린 지에벨 지음, 양영란 옮김 / 밝은세상 / 2017년 2월
저자의 국내 출간작을 모두 읽은 나로서는 이 책에 나오는 소재의 범위가 생소하게 다가온다.
기존에 다루었던 개인적인 원한이나 그것을 넘어선 억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정황들이 워낙 글로써 대할 때마다 자세한 묘사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류작가가 이렇게 섬뜩하게 글을 지어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읽은 기억이 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접하며 읽었을 때는 다분히 영화적인 스토리처럼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책에서 다뤘던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들의 등장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폭넓게 거시적인 면으로 볼 때 인류가 직면한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지적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다루면서 보다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한 점이 눈에 띈다.
누구나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 항상 죽음이 내 옆에 동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은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산다.
그런데 만일 프랑수아처럼 어느 날, 날벼락처럼 떨어진 선고를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이 책은 처음 출발부터 다룬다.
촉망받고 자수성가로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인 프랑수아는 뇌종양이란 진단을 받게 되고 항암 치료를 해봤자 길어야 1~2년밖에 살 수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모든 것을 버린 채로 홀로 자동차에 오르면서 집과 직장,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마저 연락을 남기지 않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우연히 ‘폴’이란 청년의 히치하이킹을 보면서 그를 태우게 된다.
흡사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이는 연령의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
한쪽은 뇌종양으로 인한 시한부 삶에서 죽음이란 곳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하루하루 조여 오는 고통과 구토를 지니고 사는 남자, 한쪽은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속이고 무언가에 쫓기듯 죽음이란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려는 남자의 조합은 흡사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어느 사이에 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주고받는다.
루마니아 태생의 폴, 마약밀매 조직에 몸담고 살인 병기로서 살아가던 그는 이제는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과정에 코카인을 훔쳐 달아나게 되고 이는 곧 자신의 목숨을 쫓는 조직단에 의해 시시각각 프랑수아를 본의 아니게 사건에 참여하게 만든다.
살고 싶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남자와 한창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젊은 남자의 로드무비 형식을 취하는 이 소설은 범죄를 저지른 양상에 의도한 대로 하는 범법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는 상황의 묘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과연 ‘폴’의 죄를 단칼에 결정지을 수가 있을까를 물어보게 된다.
책에는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온다.
신뢰를 받은 천사였지만 끝내는 타락의 길로 들어선 사탄은 나중에 다시 제대로 자신의 길을 들어서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두 남자의 인생을 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같이 녹여내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국제적인 폐기물 문제에 대한 거론을 한다.
실제 아프리카 모가디슈에서 국제적인 폐기물을 아프리카에 버리고 그 폐기물로 인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물론 아프리카 전체에 어두운 병폐의 현상을 고발하려 한 이탈리아 여기자와 카메라 맨의 의문의 죽음 사건을 이 책에서는 폴과 그 마약 밀매단의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저자는 두 남자의 인생 안에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이런 문제를 책 후반부에 드러내면서 기존에 그녀가 다루었던 인간의 정신적인 피폐를 통해 고통을 다룬 글들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전 작에 비해 글에서 오는 강도는 훨씬 부드러워졌으나 여전히 사회 주제 의식을 내포한 글을 내놓는 그녀의 작품들은 읽고 나서도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란 생각이 든다.
전혀 남남처럼 보이던 두 남자의 판이하게 다른 인생의 삶을 통해 인간이 만든 법과 이기적인 행태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의식을 다시 한번 주지 시켜준 책, 자자의 색다른 내용을 접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