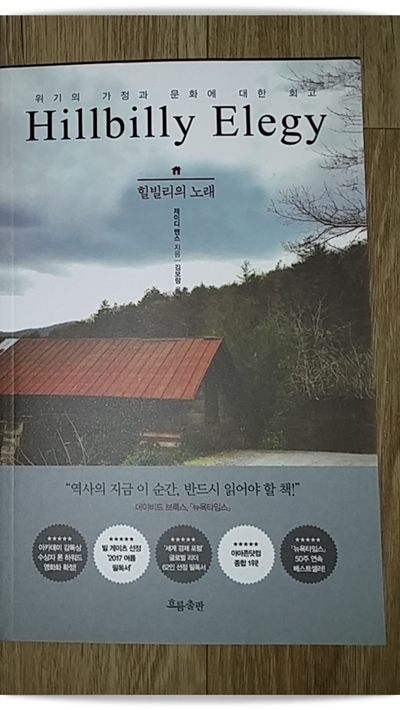
힐빌리의 노래 – 위기의 가정과 문화에 대한 회고
J. D. 밴스 지음, 김보람 옮김 / 흐름출판 / 2017년 8월
미국의 대선 결과의 통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 러스트 벨트란 말이 나온다.
우리에겐 생소했던 이 말이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왜 그리 중요한 표를 차지했을까?
바로 선거의 주요 공략이었던 정책과 시기가 맞물린 점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러스트 벨트에 살고 있는 백인이되 중상류층이 아닌 하류층, 그것도 쇠퇴해가는 공업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저자의 이력을 보니 우리나라 말로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인물이다.
1984년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30대 중반인데, 그가 펼쳐낸 자신의 이야기는 사뭇 나이에 비해 많은 것을 느끼고 살아온 전력이 들어있다.
책 제목인 힐빌리는 백인 노동 계층, 특히 소작농과 광부를 거쳐 기계공이나 육체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한다.
이 명칭에 해당되는 지역인 러스트 벨트에 속하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난 저자의 삶은 애팔래치아 지역인 켄터키주 잭슨 지역을 오고 가며 살아온 저자의 성장환경과 이어진다.
그 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정생활이란 자체가 건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이를테면 저자의 아버지는 일찌감치 양육권을 포기한 채 집을 나갔고 마약진통제에 길들여진 엄마는 헤로인까지 손을 대며 살고 있으며 익숙하다 싶으면 갈아치우는 새아버지를 맞아들이기 바쁜 인생, 그런 가운데 그를 지탱해준 주위 사람들은 배다른 누나와 할보와 할모라 불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들이었다.
저자의 삶에 전철 된 구렁텅이, 일찍 배우는 담배와 술, 총기 소지, 학교의 결석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평온한 기운이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할 정도의 분위기를 지닌 지역의 분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실적인 표현에 힘입어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저자의 동네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없을 정도의 침착한 생활의 패턴들은 그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지원하면서 서서히 다른 삶에 대한 시선을 돌리게 된 삶을 통해 또 다른 도전의 실험을 해보게 된다.
4년의 복무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나 생활의 패턴들을 익히는 과정,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기까지 그가 노력한 행동과 자신이 지녔던 계층 간의 이동의 경험을 통한 이야기들은 한 개인의 성장일기를 읽는다는 느낌 외에도 다른 문제점을 시사한다.
자신의 살아온 지역을 벗어나고 이런 생활을 탈피하고자 했던 그가 다른 상류 층격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겪은 경험담들은 때론 이질적이고 가식적인 면도 느꼈으나 그가 지냈던 지역 사람들의 고질적인 생활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점들은 미국 안에서의 백인 노동 계층이 겪는 어려운 상황들과 교육적인 해결 방안 제시, 탁상공론에 치우치는 대부업 문제 같은 장. 단점들의 제시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알게 해 준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닌 한 지역의 거대한 업체가 도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그 지역 사회의 경제활동의 연쇄적인 반응들은 어느 나라들이나 겪을 수 있다는 생각들과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되짚어 보게 하는 책인 것과 동시에 그가 여전히 자신이 살아온 고향에 대한 생각과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낙관’이란 마음가짐을 통해 역경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선 주위의 탓만 할 것이 아닌 스스로의 자신감이 필요하단 것을 느끼게 해 준 책이다.
지금도 여전히 예전의 자신의 집안사람들의 성격을 지닌 나와 자신을 이해해주고 다듬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경청하는 나란 인물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다는 저자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통해 빈곤은 왜 여전히 탈출할 수 없을까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교육적인 모든 단면들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준 책이란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