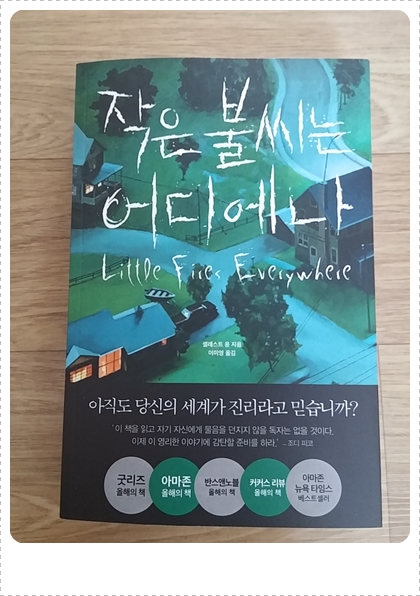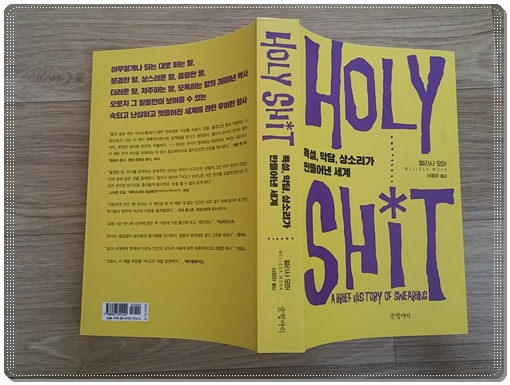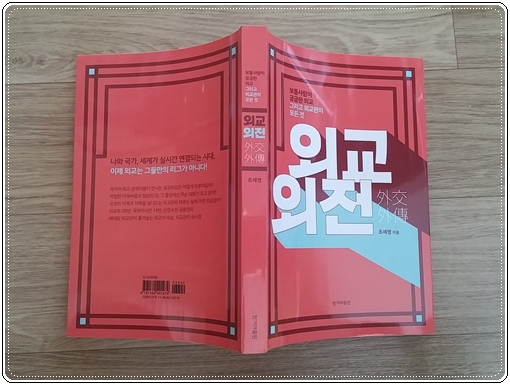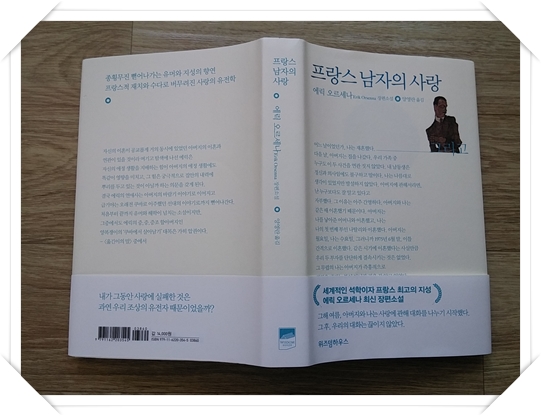 프랑스 남자의 사랑
프랑스 남자의 사랑
에릭 오르세나 지음, 양영란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8년 4월
익히 알고 있는 저자의 새로운 작품, 더군다나 소재면에서도 관심이 가는 내용에 다가서게 된 작품이다.
어느 날이었던가, 나는 재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집을 나섰다.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이 두 사건을 연관 짓지 않았다.
내 남동생은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첫 문장부터 호기심과 이혼 사유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처음에 이 책에 대한 제목과 내용면에서 두 부자간의 결혼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성이라는 공통된 점을 필두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룬 내용이란 생각을 했었다.
물론 위의 내용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는 가볍게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의 내용을 다룬 것이라면 좀 더 들어가는 이야기의 깊이를 보게 되면 저자의 다방면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 두 부자간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와 이혼을 했고 작가인 자신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이혼을 하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식 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먼 시점인 조상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통해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는 두 부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조상이 쿠바에서 정착했을 때부터 이미 유전적으로 이러한 기질이 있음을 조목조목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다.
이러한 글들, 특히 대화법들은 그야말로 프랑스적인 해학과 유머의 맛을 느껴보게 한다.
조상의 바람피우는 행동과 과정들, 이에 이어지는 아버지의 바람둥이 기질과 아들인 자신이 작가로서 글쓰기와 대화들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이어간다.
아들이 끝내 행복한 결혼의 새로운 출발점을 시작한 뒤에 다시 이어지는 불화와 이별의 연속이 있었음에도 두 남녀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안부 편지를 보내는 장면은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음에도 여전히 유쾌하게 그려진다.
아버지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의… 먼 조상대부터 이미 내려온 유전자가 아님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아들의 이름이 실은 저자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의 사실성이 같이 들어있다는 느낌마저 들게하면서 두 부자가 나누는 대화들은 사랑과 이별, 그 외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는 색다름을 준다.
부부로서의 오랜 해후를 마치는 삶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두부자가 나누었던 대화들은 성인이 되어 서먹서먹해지는 부자지 간의 느낌들을 생각해보는 이면에는 이러한 대화 자체가, 특히 남자 대 남자로서 느끼는 성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생각과 이별에 대한 느낌들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보다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사이를 느껴 볼 수 있었던 책이 아닌가 싶다.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갯벌 채취법’과 ‘의식 성찰법’과 ‘행복 성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 조상들인 부부가 쿠바에서 맞바람 피는 장면들은 잊지 못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