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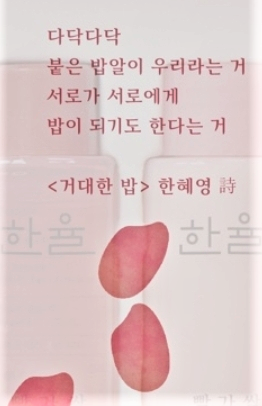
아침부터 카톡이 요란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열어보았다.
플로리다에서 거주하는 한혜영 시인이 올린 글이다.
”제 시 ‘거대한 밥’ 중에서 일부 문구가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홍보에 쓰였네요.”
그러면서 사진이 올라왔다.
다닥다닥
붙은 밥알이 우리라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기도 한다는 거
동문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시끄러울 지경으로 오전 내내 축하 글이 도배해댔다.
그중에서 흥미로운 글도 있었다.
“아모레 화장품 포장마다 그 싯 귀가 있겠네요.
살짝쿵,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큰 회사에서 얼마 받았는지 궁금해요.”
“물론 받았는데……. 손이 작아서 많이 달라고 못 했네요.
얼마면 되겠냐고 묻는 걸, 산업은행 본점에 내 시가 현수막에 걸렸을 때 받은 금액을
말했어요.”
“산업은행 본점에 걸렸던 현수막하고는 다르지요. 엄청나게 큰 광고인데.”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건물에는 한혜영 시인의 시가 거대한 현수막에 쓰여 걸렸다.
2019년 3월이었다.
아무리 숨었어도
이 봄 햇살은
반드시 너를
찾고야 말걸

한혜영 시인의 시가 걸렸던 현수막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그런데 얼마 줄까 묻는 걸 산업은행에서 준 만큼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다.
“산업은행 본점에 붙었던 현수막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건 큰 광고인데.”
하긴 그렇다. 현수막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광고는 아니다. 누구나 보고 봄을 만끽하라는
서비스 차원의 제공이었다. 하지만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광고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상업용 홍보인 것이다.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수막과 비교는 안 될 말이다.
원래 시인이란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은행이라는 데는 워낙 짜서……. 시답지 않게 받았지만,
화장품 회사한테도 거기에 맞추어 달라고…….
그래도 광고 효과가 나니 좋은 일이지요.”
밑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억울해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나 보다.
당장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교보문고에 걸린 글은 120만 원 받았다던데,”
떠도는 말이니 확인할 수는 없는 말이지만 그럴 듯하다.
광화문 교보문고 빌딩 현수막에 시인들의 싯귀가 걸리곤 하는데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
올라가면서 나태주 시인이 떴다고 시인 스스로 EBS 초대석에 나와서 이야기하는걸
들은 적이 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름다운 시 구절을 이야기하다가 돈 이야기로 바뀌니까 금세 달콤살벌하다.
시인이 돈 보고 시 쓰는 것도 아니고, 시가 돈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만인이 공감하고 즐기면 되는 게 시고, 그것도 오래 가면 더 좋은 게 시고.
시는 노래고 노래는 사랑받을 때 빛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