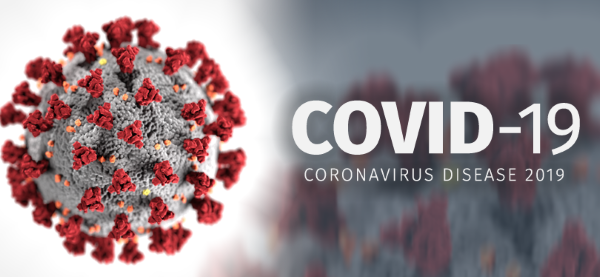
따스한 봄볕이 듬뿍 내리쬐는 뒷마당 텃밭에서 남편은 흙을 주무르며 좋아했다.
묵은 뿌리를 걷어내고 굳은 흙을 뒤집었다. 닭똥을 세 포대나 사다가 섞었다.
작년에 심었던 채소는 올해도 똑같이 심었지만, 심을 때마다 새롭다.
채소 기르는 게 취미인 남편은 유기농을 먹는다는 자부심도 강했다.
가지는 모종을 사다 심고, 호박, 상추, 시금치는 씨를 뿌렸다.
텃밭이 보기에 가지런한 게 제법 그럴듯하다.
남편은 뭘 해도 솜씨 나게 꾸미는 데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뒷마당에 서 있으니 평화와 질서까지 돌아온 것처럼 사람 사는 집 같다.
보름째 되는 날이었다. 남편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단다.
나는 글 쓰던 게 남아 있어서 서재에서 따로 잤다.
일어나자마자 마스터 베드룸으로 건너갔다.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의 내의가 땀에 흠뻑 젖어 있다.
고것도 일이라고, 텃밭 좀 가꾸더니 몸살이 있나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의구심이 들었다.
설마 하는 마음과 몸살이겠지 하는 마음이 동시에 떠올랐다.
은근히 겁이 나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 요양원에서 발생했고 그중에 9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만에 하나 코로나바이러스가
남편에게 침입했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오후가 지나도록 남편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단다.
나는 우유라도 마시라고 했으나 남편은 우유는 마시지 않고 수박 주스만 겨우 마셨다.
빈속에 해열제 타이레놀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흰죽을 끓여 죽과 양념간장을 가져갔다.
그게 3월 말이었다.
남편의 열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심란하고 두려워서 못 견딜 것 같았다.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며칠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낫지 않거든 다시 연락하라는 말만 들었다.
밤이면 열이 더했다. 열을 재 보니 화씨 100도가 넘었다. 몸이 불덩이처럼 펄펄 끓었다.
얼음으로 이마를 감싸고 옷을 다 벗겼다. 욕조에 찬물을 가득 채우고 그 속에 들어가
있게도 해 보았지만 열기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캘리포니아에 내려진 자가 격리령 때문에 직접 들르지는 못하고
KN95 마스크 5장을 택배로 보내왔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란다.
나는 한 번도 마스크를 써 보지 않아서 실제로 써 보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
숨쉬기도 편치 않았다.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나다니……
몸이 펄펄 끓는 그이를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흘이 되기도 전에 남편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주치의는 몇 마디 묻지도 않고 독감 테스트 먼저 했다.
음성으로 나왔다.
― 밤에는 열이 얼마나 오르던가요?
의사가 물었다.
― 100도가 넘었어요. 102도, 103도로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나는 엄살이 뚝뚝 떨어지는 어투로 말해 주었다. 의사는 기침과 두통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해 주었다.
간호사가 큐팁(면봉)을 남편의 코 깊숙이 넣고 휘저은 뒤 샘플을 가져갔다.
샘플을 가져간 다음 무엇인가 좋은 처방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해 주는 건 없었다.
해열제나 먹으면서 푹 쉬라고만 했다. 볼품없는 늙은이가 돼서 푸대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아누웠다.
타이레놀, 비타민C, 감기약만 먹으면서 이제나저제나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픈 사람보다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더 애가 탄다.
하나라도 챙겨 먹이려고 수박 주스에 블랙베리를 섞기도 하고 포도를 섞어 믹서기로
갈기도 했다.
그이는 밤에 잘 때마다 열이 심해서 몇 번이나 땀으로 흠뻑 젖어서 깨곤 했다.
물 마시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땀만 흘리는 바람에 기력이 다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먹은 것도 없으면서 뱃속이 울렁거리고 온몸이 녹신녹신 쑤신다고 했다.
음식은 하나도 먹지 못하고 국하고 주스만 간신히 마시고 온종일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지냈다. 죽도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약과 비타민C도 갈아서 가루를 내어 먹였다.
남편은 뼈만 남은 것처럼 말라만 갔고 몸무게가 20파운드나 빠졌다.
집에서 테스트 결과를 기다린 지 거의 일주일이나 돼서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해 달라는 주의사항만 들었다. 기가 막혔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아픈 지 보름쯤 지나면서 죽이나 주스, 약같이 가벼운 음식도 먹는 족족 설사를 해 댔다.
설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침도 했다. 기침을 참지 못하고 연거푸 쏟아 낸다.
겨우 진정되는가 하면 또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다.
그이는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겨우 일으켜 세우면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화장실에 가지도 못했다.
남편의 코로나19 증상이 심한데도 병원에서 치료조차 해 주지 않는 게 야속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에 대처하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