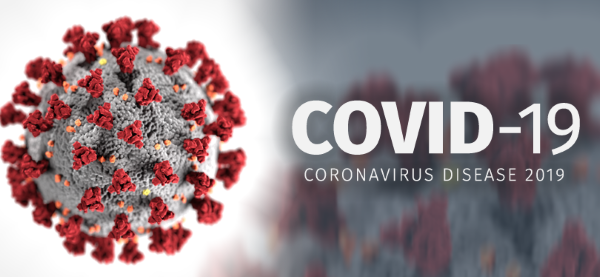
5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아무래도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이어서 제임스에게 미리
연락해 놓으면 알아서 이모부를 잘 챙겨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임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 것으로 봐서 바쁜 모양이다.
이번에는 직접 병원 리셉션 데스크로 전화를 걸었다. 안내양이 전화를 받는다.
― 닥터 제임스 리를 부탁합니다.
잠시 조용한 것으로 봐서 제임스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나타난 안내양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을 들려준다.
― 닥터 리는 2주 전에 퇴직했습니다.
나는 안내양의 말을 잘못 들었나 하고 내 귀를 의심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좋은 직장이라고 내게 자랑했는데, 그만두다니?
나는 안내양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물었다.
― 아니,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만두다니요? 한 번 더 알아봐 주세요.
다시 주문했지만, 안내양의 말투는 단호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의구심도 들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조급한 때라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급한 대로 남편이
갈아입을 내의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렀다.
마스크에 투명 안면 가리개를 쓰고 일회용 비닐 보호 복장으로 무장한 젊은 구급요원
둘이서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남편을 들것에 눕히고 흔들리지 않게 위아래 두 곳을 단단히 조였다.
몸무게가 빠질 대로 빠진 남편을 가볍게 들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앰뷸런스는 먼저 달리고 나는 차를 몰아 뒤따랐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남편을 곧바로 밀폐된 병실로 응급 침대를 밀고 들어갔다.
임시 병동이라고 했다.
의료진들은 남편을 지렁이 보듯 대하면서 만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 눈치였다.
아내인 내가 가까이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주지 않았다. 기가 막혔다.
지금까지 나는 남편 곁에서 지냈는데, 여태까지 나 몰라라 하던 병원이 갑자기 야단법석을
피우다니? 나는 입원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렸다.
어느 병동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입원실이 비지 않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점심을 걸렀는데도 배고픈 줄도 몰랐다.
자그마치 8시간을 기다린 다음 오후 늦게야 비로소 입원이 성사되었다.
그나마 입원이 되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누군가 죽어서 나가는 자리를 기다리느라고 늦었단다.
밤늦게 텅 빈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동안 누워 지내던 남편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공기를 갈아치울 생각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밤공기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쓸쓸한 적막감도 함께 몰려왔다.
날이 밝자 남편을 방문하러 가면서 잠옷과 슬리퍼, 면도기를 챙겼다.
남편은 이미 단단한 문이 잠긴 병실에 고립되어 있어서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환자 면회가 금지되어 있어서 간호사에게 전해달라며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럴 때 제임스는 어디 간 거야? 그의 전화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받지 않았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부터 꺼냈다.
언니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깜깜한 듯 무슨 병이라도 났느냐고 묻는다.
― 그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단 말이야.
― 코로나? 그거 무서운 전염병이잖아? 같이 지냈다면서 넌 안 걸렸니?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사람이 죽어 가는데, 한가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어디 있어? 제임스가 병원 응급실에
없다던데 어디 갔어?
언니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한다.
― 얘, 너 빨리 체크해 봐. 네 나이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다더라.
― 그게 아니고, 제임스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걔 어디 있어? 전화번호라도 가르쳐줘.
― 글쎄. 나도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얼마 전에 병원 일 그만두고,
집도 헐값에 팔아치웠다더라. 수잔과 함께 남태평양 피지 아일랜드로 간다고 했어.
지금쯤 거기서 지내겠지……
― 의사며 간호사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피지 아일랜드로 피신했다고?
나는 기가 막혀서 입이 딱 벌어졌다.
― 그게 뭐 이상하니? 걔네들도 사람인데 살고 봐야지, 안 그러니? 얘,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응급실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빨리 그만두기를 잘했지……
나는 맥이 탁 풀렸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간호사라는 사람이
남쪽 따뜻한 남태평양 섬나라로 피신 가다니.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꼴값을 떠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듣고 넘기기엔 속이 뒤틀려서 참을 수가 없기에 한마디 해 주었다.
― 휴양지로는 타히티가 유명하다던데 왜 하필 거지 같은 피지야?
비꼬는 투로 입이 씰룩이는 걸 보여 주지 못하는 게 아쉬웠다.
― 내가 아니? 피지가 저렴하다더라. 피지에 섬이 삼백 개가 넘는데, 비티레부라나?
뭐 그런 섬인데 거긴 더 싸고 좋다더라.
더는 이야기해 봤자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환자 방문 시간은 정해져 있었다. 오전 11시~12시, 오후 3시~4시 사이에만 환자를 볼 수
있다. 나는 매일 하루에 두 차례씩 남편을 보러 갔다.
면회라고 해 봐야 고작 창문 너머로 병실에 누워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비닐 호스 두 줄이 남편에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간호사더러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돌려놓은
핸드폰을 건네주었다.
남편은 핸드폰을 받을 때면 늘 스피커폰으로 받곤 했었다.
핸드폰도 들어 올릴 기력이 없어서 베개 머리맡에 놓았다.
남편에게 핸드폰이 전해지면서 그나마 몇 마디 말이라도 나눌 수 있었다.
― 여보. 좀 어때요? 낫는 것 같아? 힘들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 해요. 힘내.
남편은 누운 채로 겨우 고개를 돌리고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했다.
―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