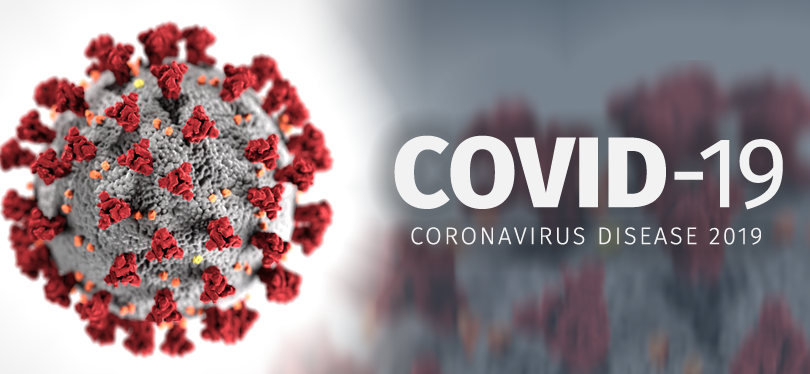
7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지, 보름째 되는 날이다.
그이는 중환자실에서도 복도 끝에 있는 병실로 옮겼고 방에는 유리문이 겹겹으로
닫혀 있었다. 첫 번째 문 뒤에서 의료진은 얼굴 보호막과 보호 장비로 바꿔 입었다.
두 번째 문 뒤에 환자인 남편이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그이의 얼굴을 감싸고
투명 플라스틱 줄이 얼기설기 뻗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위중함을 알 수 있었다.
입원이 늦어진 게 치명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환자와 핸드폰으로 말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스피커폰으로 돌려놓은 핸드폰을 간호사가 남편 베개 머리맡에 놓았다.
―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힘내. 힘내야 이겨낼 수 있어. 빨리 일어나야
집에 오지.
그이는 아무 대답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표정이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던 남편이 겨우 뭐라고 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숙여 귀를 그이의 얼굴에
대다시피 하고서야 알아듣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그이의 말을 들려준다.
― 집에 가고 싶어……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울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말하려 했으나 말이 되지 않았다.
겨우 한마디 했다.
― 사랑해, 많이……
복도 끝에서 면회 시간이 다 지나도록 서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지켜보았다.
딸은 이미 한 번 다녀갔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아빠의 위중함을 알렸다. 아들은 토요일에
며느리와 함께 방문했다. 우리는 두 개의 유리문을 통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남편을 볼 수
있었다.
그이는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았다. 열댓 발짝 벌어진 간격을 사이에 두고 아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였다. 힘내라는 표시였다. 그리고 수화로 하트를 그려 보였다.
남편은 아들을 알아보았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다음 날도 나는 남편을 보러 병원으로 출근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이는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공호흡기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간호사에게 따지듯이 물어보았다.
매사에 사무적인 간호사는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서 장비를 바꿨다고 했다.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무섭고 떨렸다.
*
5월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비가 내린다. 비가 와도 조금이 아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반세기를 살았어도 5월에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건 처음 보았다.
2층 서재에서 창문을 열고 뒷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뒷마당 텃밭에 남편이 심어놓은 어린 채소들이 비를 맞으며 좋아한다.
우산을 쓰고 나가 보았다. 상추, 가지, 호박, 부추 그리고 시금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번 맞고 모두 좋아서 해맑은 표정을 짓는다.
남편이 발병하기 전에 심어놓은 채소가 많이 자랐다. 직접 길러 먹자던 채소다.
채소는 먹음직스럽게 쑥쑥 자라는데, 정작 먹을 사람은 없다.
남편 면회하러 가려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았다.
나는 아침을 먹고 갈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서는데 전화가 울린다.
화면에 뜬 번호가 병원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 헬~ 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면서도 불길한 느낌이 엄습해 왔다.
―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인데요, 환자분 부인 되시지요?
환자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단다. 심폐소생술이라니? 그렇다면 심장이 멎었다는 말이
아닌가? 나는 까무러칠 것처럼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다. 수화기를 놓쳤는데
어디로 굴러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허둥지둥 빗속을 달려 병원으로 향했다.
안내 요원은 면회 시간이 아니어서 병실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가로막았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종말’이 아니냐고 간청했다.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내 이마에 체온을 스캔해 보고 들여보낸다.
유리문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있는 남편과 의료진의 허둥대는 모습이 보였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남편 손을 잡을 수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가슴이 저며
왔다.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과 같이 산 40년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다니……
진작에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집에서 죽게 내버려 둘 걸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한국에서 오지 말라고 할 걸 하는 후회도 일어났다.
유리창 너머로 심장 모니터 화면의 그래프 물결이 느리게 내려가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