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자크의 식탁
앙카 멀스타인 지음, 김연 옮김 / 이야기나무 / 2016년 8월
프랑스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패션이고, 미슐랭 가이드란 책이 생각난다.
예술의 도시란 명성답게 전 세계의 패션의 현상의 중심지 중 하나이면서 역시 미식가들을 위한 별도의 별점을 통해 그곳의 맛난 음식을 경험하게 하고픈 욕구를 발산시키는 곳-
그렇다면 프랑스란 나라의 이러한 중심지로의 태동은 어떻게 발전이 되었을까?
그중에서도 ‘레스토랑’이란 이름이 누구나 쉽게 입에서 나올 정도의 보통의 명사로서 불리게 된 프랑스의 역사적인 발전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에 대한 재미난 에세이를 접했다.
그 중심엔 전혀 의외의 인물인 발자크가 있다.
발자크 하면 우선적으로 그와 떼려야야 뗄 수 없는 커피가 생각나고 그의 영원한 연인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의 문학의 원천적인 발산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커피 외에도 이 책은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남긴 작품을 통해서 그가 부여한 음식의 세계와 책 속의 등장인물들 간의 연관 관계를 통해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레스토랑의 변천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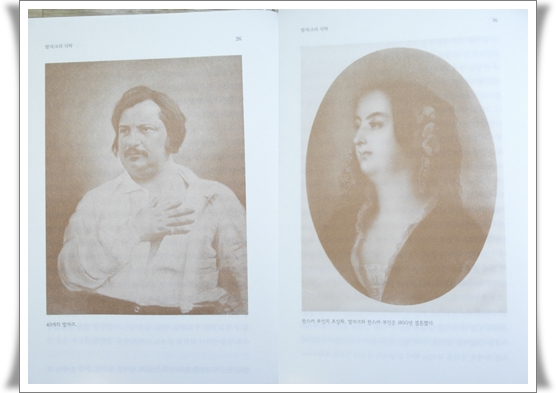
사진을 보면 그는 조금 통통(?)한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는 의외의 창작에 몰두할 때면 음식을 멀리한 절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작품이 끝나고 나면 무섭게 먹어대는 식욕의 발산 욕구는 아마도 그동안 한 곳에 몰입했던 나머지 자신의 부족했던 점들을 보충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가 그의 작품에서 드러낸 식탁에 오르내리는 음식들은 기존의 작가들의 작품에선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그가 음식에 집착했던 것은 어릴 적, 보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기숙사 생활을 했던 탓도 있었고 당대의 사회상을 짚기 위해서였단 구절만 봐도 그가 생각했던 이러한 발상은 그 후 여러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작품 속의 소품이자 비유, 그리고 음식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의 전개가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창작들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란 나라의 음식의 발전은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준 일대 변화의 기회를 가져왔다.
왕의 음식을 만들던 요리사들이 혁명의 회오리바람 속에 살기 위해 궁을 탈출하고 거리로 나가 자신들이 익힌 음식 솜씨를 가게를 열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고위층의 음식이란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보통의 사람들도 맛볼 수 있는 유행의 시대를 타게 된 것이 지금의 프랑스 요리의 첫걸음이자 그 후 이러한 음식의 변천은 식재료의 변천사를 가져오게 된다.
책의 구성은 발자크의 어린 시절부터 엿볼 수 있는 음식에 관한 에피소드, 파리의 식사 시간의 변화를 가져온 사회상의 흐름, 여기엔 지금의 레스토랑이란 존재가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프랑스 사람들에게 어떤 기능과 자리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식사 예법이라 함은 당시만 해도 예절과 규범에 얽힌 귀족들만의 것, 일테면 특별한 날들의 식탁이라 이름을 붙인 제 3장을 보면 화려한 저녁식사와 연회가 주 무대로써 식탁의 천은 무엇을 깔고 장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는 발자크가 ‘인간희극’이란 대 역작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계층과 야망들을 음식을 통해 들여다보는 계기를 엿볼 수가 있게 한다.
그렇다고 귀족들만의 식사만 그린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인 가정, 특히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탓에 교통의 미개발로 인한 도시 소식에 대한 둔감함, 어느 가정에서나 부릴 수 있었던 하인들의 존재가 부각이 되면서 식재료값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는 주인과 이를 어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가정에 진심으로 충실했던 하인들과의 신경전을 들여다보는 재미와 함께 레일 시장의 복잡하고도 생기 넘치는 묘사도 인상적이다.

발자크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음식과 인간관계는 인간이 어떤 것에 심취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로 음식이 주는 매료에 흠뻑 빠진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통해 구두쇠가 음식에 음식에 인색했던 장면들과 대사, 또는 지나치게 다른 인간관계에 등한시했던 점에 비해 유독 음식에만 집착했던 부류들을 통해 음식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 과정들이 재미를 선사한다.
발자크가 생각했던 연애의 이야기 속에는 침대와 식탁이란 제목을 통해 그가 주장했던 다른 작가들이 썼던 것과는 반대로 식탁과 침대의 쾌락은 서로 이루어질 수없다는 주장이 반영된 작품들을 통해 그가 써왔던 연애관을 다룬 부분들을 다시 읽어보고 싶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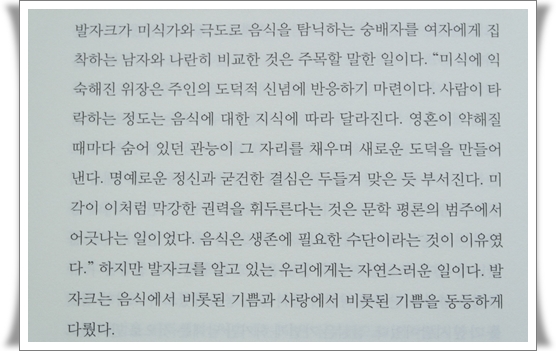
누구나 살기 위해 음식을 먹지만 발자크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 속에서는 음식이란 것이 역사와 사회상의 신분 붕괴, 주인과 하인들 간의 대립,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었던 ‘슈베’란 공간이 지녔던 특이한 상황들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한 나라의 역사와 함께 한 음식의 역사 변천사를 보는 책이기도 하다.
연이어 전개되는 ‘인간희극’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심리와 식탁에 오르내리는 음식들을 통해 역사, 문화, 사회,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던 발자크의 식탁은 그야말로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한 나라의 한 시대의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알길 원하는 사람들에겐 재미와 지식을 알게 해 주는 책이란 생각이 든다.

프랑스 요리가 비싸고 맛있다는것만 알고 있는
나같은 사람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행중 몇가지만을 먹어봤지만 제입세도
맞던데 작가의 시선으로 작품속에 등장시킨
음식들에 관심이ㅈ갑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혁명시기였던 만큼 다양한 계층들의 삶의 모습과 음식의 모습들이 신선함을 준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