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오솔길’의 출발지점은 도산면 단천교이다. 단천교 바로 옆에 ‘녀던길(옛길)’이란 이정표가 있고, ‘도산서원에서 청량산까지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은 퇴계 선생께서 즐겨 다니시던 오솔길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퇴계 선생의 시적 감흥을 현장을 거닐며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맞은편에는 ‘녀던길’이란 비석도 세워져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동강길 따라 올라가는 퇴계오솔길. 청량산이 배경으로 보인다.
강길 따라 청량산으로 올라간다. 이 길은 순간적으로 감흥은 일어나지만 그리 길게 가지는 않는다. 약 2㎞를 비슷한 길로 계속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2㎞쯤 지나 퇴계의 첫 시비(詩碑)가 나오고 전망대에 이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온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청량산 깊은 골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사이로 곡예를 그리며 빠져나오는 낙동강 줄기는 정말 한 폭의 두루마리 진경산수화를 그려놓은 듯했다. ‘겸재 정선이 어떻게 이런 멋진 곳을 와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정표가 있어 길을 잘 안내해준다.
내려선 강둑길은 갈대로 뒤덮였고, 덩그러니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한그루는 더욱 운치를 더했다. 한발 한발 옮기는 발걸음은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 풍광을 감상하느라 발길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변의 조약돌은 갖가지 모양으로 눈길을 끌었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발했다. 갈대로 뒤덮인 모래밭을 지날 때는 살랑거리는 갈대가 귀가를 살살 간질이는 듯한 느낌이다.

강가에 갈대가 우거져 더욱 운치를 자아낸다.
퇴계가 숙부에게 논어를 배우러 청량산에 가면서 오죽했으면 “그림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한번 나온 감탄은 그칠 줄 몰랐다. 마침 날씨가 맑아 청량산 선학봉과 자란봉을 연결한 하늘다리까지 조망이 가능했다.

미천장당 낙동강길.
‘낙동강은 청량산을 지나서야 비로소 강의 모습을 갖춘다’라는 말이 있듯이 청량산의 깊은 계곡에서 나오는 물과 합류해서 제법 강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곳의 강줄기를 ‘미천장담(彌川長潭)’이라고 한다. ‘여러 지천이 모여 이룬 길고 깊은 소’의 뜻이겠다. 퇴계가 그냥 지나칠 리 없다. ‘도미천망산(渡彌川望山)’을 남겼다.
‘굽이굽이 맑은 여울 건너고 또 건너니 / 우뚝 솟은 높은 산이 비로소 보이네 / 맑은 여울 높은 산이 숨었다가 나타나니 / 끝없이 변한 자태 시심을 돋궈주네.’
퇴계만이 아니라 누구나 시적 감흥이 생길 법한 강변길엔 또 의외의 발자국이 나온다. 해변가에나 있을 법한 공룡발자국 흔적이 이곳에도 뚜렷이 남아있다. 역사적 사실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공룡 발자국 같이 생겼다.

공룡발자국이 암석으로 새겨져 있다.
길은 오솔길로 변했다. 풀들이 길을 덮은 호젓한 길이다. 옛날에 사람이 살았을 법한 장소에 정자와 연못이 탐방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했다. 퇴계 시비가 새겨져 있어 잠시 쉬어가는 객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정자가 있는 휴식처.

정자 바로 옆에는 퇴계 시비가 있다.
퇴계오솔길은 시야가 확 트인 강변을 다시 만나자 외줄처럼 일직선이 된다. 강 옆에 우뚝 솟았지만 상단은 미끈하고 평평한 바위가 있다. 퇴계가 청량산을 오가면서 잠시 쉬었다 간 바위라고 전한다. ‘경암(景巖)’이라 부르며 여기서도 시 한수를 선사했다.
‘부딪는 물 천년인들 다할 날 있으련만 / 중류에 우뚝 서서 기세를 다투누나 / 인생의 발자취란 허수아비 같은지라 / 어느 누가 이런 곳에 다리 세워 버텨보리.

낙동강길 반대편은 주상절리 같은 절벽도 볼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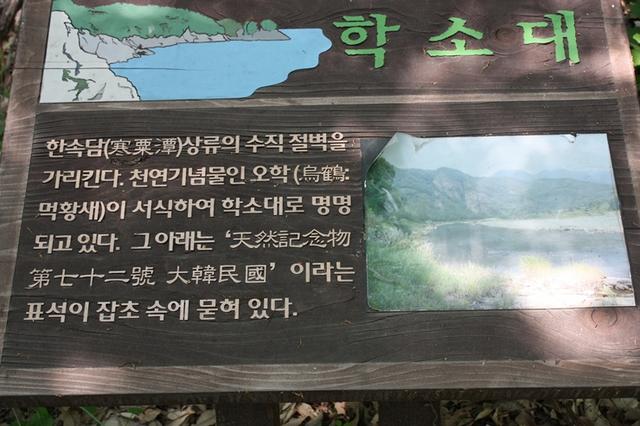
학소대 안내판.
길은 계속되고 아름다운 풍광도 연속이다. 경암을 지나니 곧이어 한속담(寒粟潭)이다. S자로 휘도는 낙동강이 흐름을 멈춘 듯 담을 이룬 곳이다. 말을 타다 걷기도, 또는 가마를 타기도 했을 법한 퇴계는 절경에 반해 또 ‘한속담(寒粟潭)’ 시를 읊었다.
‘벌벌 떠는 여윈 말로 푸른 뫼를 넘어가서 / 깊은 골짝 굽어보니 찬 기운이 으시시 / 한 걸음 두 걸음 갈수록 선경이라 / 기괴한 돌 긴 소나무 시냇가에 널렸구려.

이정표가 길을 안내해준다.
한속담 바로 옆에 거대한 수직절벽인 학소대(鶴巢臺)를 만난다. 천연기념물인 오학(烏鶴, 먹황새)이 서식하여 학소대로 명명했다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학의 분비물이 바위에 묻어있는 듯하다.
이어 퇴계오솔길의 마지막 지점인 농암종택에 도착했다. 농암은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참판, 형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종1품 숭정대부에 이를 정도로 화려한 벼슬을 했지만 이런 수식어보다는 무위자연의 삶을 즐기며 강호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른바 한국 ‘강호문학의 창도자’가 바로 농암 이현보이다. 그는 퇴계보다 약 30여년 빠른 인물로 퇴계가 아버지같이 모시며 따랐던 것으로 전한다.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변에 있는 경암.

경암 안내문.
농암종택은 1975년 안동댐이 들어서면서 수몰을 피해 여기저기 흩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 현재의 위치에 재건했다. 종택 바로 앞으로 흐르는 강물의 벽이 벽력암이다. 벽력암은 태백에서 떠내려 온 뗏목들이 절벽에 부딪혀 우레 같은 소리를 냈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宣城誌(선성지)>에는 ‘벽력암 아래에 있는 깊은 연못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농암종택 첫 건물인 강각.
종택 바로 옆에는 그네도 있고, 널찍한 공터도 있다. ‘퇴계오솔길’은 여기까지다. 이후 청량산 가는 길은 도로로 포장돼 있다.
퇴계의 청량산에 관한 기록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끝내기로 하자. 퇴계는 1552년 명종 7년에 주세붕의 <청량산 유산록>에 발문을 다음과 같이 붙였다.
‘위대하여라, 선생이 이 산에 얻은 것은! 홍몽한 상태로부터 음양의 기운이 나뉘어 높은 하늘과 깊은 바다의 기운이 형체를 응집한 이래로 몇 천만 겁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갈무리한 승경과 땅이 감추어 둔 기이한 구역이 바로 선생의 글을 기다려서야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이 산으로서는 커다란 만남이 아니었겠는가? 하물며 이 산의 여러 봉우리들이 모두 불경의 말과 여러 부처의 음란한 이름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정말로 이 선경의 모욕이요, 우리 유학자의 수치였다. 선생이 일일이 고쳐 주시고, 통렬하게 씻어내어 주셨으니, 그로써 산신령을 위로하고 정채(精彩)를 빛나게 하신 업적이 얼마나 크냐!’
주세붕은 퇴계의 글을 보고 ‘정말 어린아이나 아낙네가 지을 만한 그런 글이다’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퇴계는 그 점에 한마디 언급 않고 주세붕을 선배로서 깎듯이 예우했다. 넉넉한 인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넉넉한 인품이 지금 500여년을 지나 다시 그 길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학소대
퇴계는 말년에 청량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다시 ‘산을 바라보며’라는 시를 한수 읊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구름 메(산) 없으리오 / 청량산 육육봉이 경개 더욱 맑노매라 / 읍청정 이 정자에서 날마다 바라보니 / 맑은 기운 하도 하여 사람 뼈에 사무치네.’

농암종택엔 숙박도 가능하다.
그는 청량산 바로 앞에 있는 건지산 자락에 묻혔다. 죽어서도 청량산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의 시 ‘송별’이 ‘퇴계오솔길’ 가는 길 중간에 나오는 정자의 비석에 새겨져 있다.
‘그대 가니 이 봄을 누구와 더불어 노닐고(君去春山雖共遊 군거춘산수공유) / 새 울고 꽃 떨어져 물만 홀로 흐르네(鳥啼花落水空流 조제화락수공류) / 이 아침 물가에서 그대를 보내노니(今朝送別臨流水 금조송별임류수) / 그리워 만나려면 물가로 다시 오리(他日相思來水頭 타일상사래수두)’
퇴계오솔길에 가면 퇴계와 그의 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 모두를 감상할 수 있다.

퇴계오솔길 따라 아름다운 길은 이어진다.
새옹
06.27,2010 at 5:58 오전
정말 아름다운 산천…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찾아보고 싶네요.
한국인들은 참 복 많은 환경속에 삽니다.
삼천리 화려 금수강산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