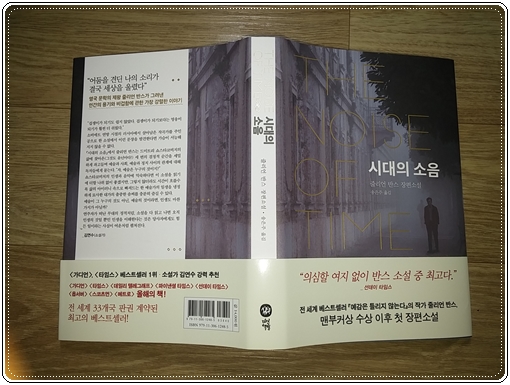 시대의 소음
시대의 소음
줄리언 반스 지음, 송은주 옮김 / 다산책방 / 2017년 5월
한 인간의 무한한 창작의 열의와 욕구의 발산은 그대로 그 자신의 몫으로도 남지만 그 이후의 후세대들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오래도록 인간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게 마련이다.
혹독한 평가이거나 아니면 당 시대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더라도 후대에 이르서 평단의 결과가 바뀌어 오히려 좋은 결과물로 남게 될 경우는 더욱 그렇기도 하지만 이미 유명 인사로서의 지명도를 가진 인물을 소설 속에서 다룬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독자들은 내리게 될까?
줄리언 반스의 신작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흥분감, 더군다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실존 인물의 인생을 역사 속에서 녹여냈다는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은 전작들 못지않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쇼스타고비치-
익히 알려진 소련의 유명 음악가라고, 특히 그의 작품은 연주하기 어렵다는 라흐마니노프에 비교된다는 사실만 알뿐 클래식에 관해선 크로스오버와 귀에 익은 음악 정도만 알고 있었던 내겐 흥미로운 인물로 다가왔다.
사실 실존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녹여낼 때만큼 창작자들의 고뇌도 만만찮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상상이 가는바, 줄리언 반스의 글은 역시 실존 인물의 창작과 예술의 세계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한 개인의 고뇌를 역사라는 이름 속에 작지만 큰 빅의 그림자의 대립을 통해 적절히 잘 녹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여기 한 남자가 승강기 옆에 내내 서 있다.
담배만도 벌써 다섯 대를 피웠고 그의 이런 불안은 차라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에 낯선 미지의 인물들이 자신을 어서 데려가 주길, 그래서 얼른 죽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편한 잠옷? 하긴 이런 옷을 입고 자길 원하는 부인의 말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정장을 갖추고 침대에 누워 있고 옆에 가방을 가지런히, 언제라도 나갈 준비태세로 잠을 취하는 이 사람, 바로 쇼스타고비치다.
그의 탁월한 음악적인 해석과 작곡 능력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촉망받았으나 윤년마다 세 번의 결정적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만 했던 암울한 시기를 보낸 음악가이다.
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의 음악적인 활동은 두 번째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 Ledi Makbet Mtsenskovo uyezda>이 스탈린에 의해 분노를 사게 되면서 당국의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고 이후 이 작품은 올릴 수가 없게 된다.
이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음악 동료들이 끌려가 죽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 또한 그런 날이 멀지 않으리라 예상했던 만큼 삶에 대한 생각,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생각은 이후 죽음을 비켜가게 되면서 당국의 비판을 수용하게 되고, 당국이 원하는 음악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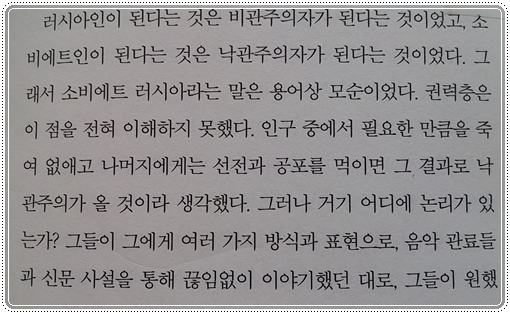

당시 소련에서 일어났던 형식주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신의 작품에 비하면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여겨지는, 음악가의 삶은 점차 모순적인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수긍하되 내면적으로는 창작에 대한 괴로움을 동시에 안고 가는, 아이러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그의 삶은 스탈린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소련 문화 자체가 통제받는 시기를 거쳐 세계 2차 대전과 후르시쵸프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다른 음악 창작활동에 전환점을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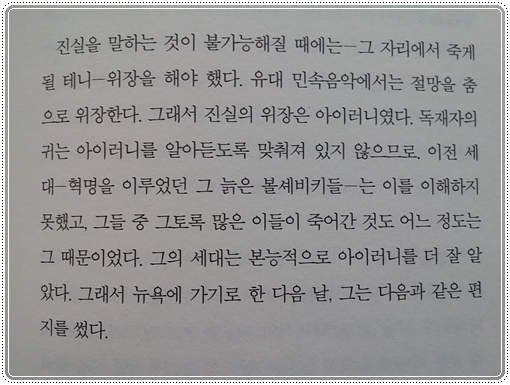
저자의 조사와 그 당시 쇼스타코비치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지에 대한 상상을 근거로 내세운 이 작품은 제목 자체가 주는 시대의 소음으로 인한 창작자의 작품 활동을 통해 어떻게 당국의 검열과 교육, 통제를 받고 서방에 날아가서까지 당국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의 인생 전편에 흐르는 여러 가지 고심에 찬 모습들을 잘 그려내고 있다.
어느 시대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위의 시대, 특히 세 시기를 걸쳐서 살아갔던 많은 예술인들이라면 자신의 원대한 창작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초점에 맞추어 작품을 생산해내야만 한다면, 그것을 거절했을 경우에 어떤 보복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관계자들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하는 상태에서라면 과연 우리들은 쇼스타고비치가 해왔던 행동들을 비난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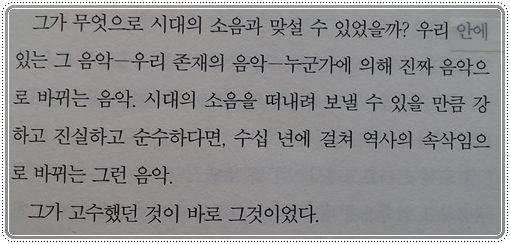
그 역시 이러한 부조리한 시대에서 오는 통제와 간섭,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과 고통이 사방에 널려있던 그 시대에 자신보다는 그 자신의 가족들과 주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행해야만 했다는 현실성, 그렇기에 작품 속에 당국의 심경을 거슬리지 않고 자신의 창작의 뜻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수단으로 아이러니를 매개로 했다는 점은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그른 행동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예술의 진위성, 진정한 예술인으로서의 고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다.
살아오는 내내 끝없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차라리 미리 죽은 동료들을 부러워해야만 했던 당시의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데서 체제의 불합리에서 오는 한 나약한 예술가의 그 나름대로의 치열했던 삶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비겁함의 차이는 결국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체제의 통제에서 그 자신 스스로가 당국에 협조를 하되 자신만의 예술적 신념과 창작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도 곳곳에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시대의 소음을 연일 들으면서 살아가 는 우리들에게 그가 들려주는 예술과 창작에 대한 열의는 소음마저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의 생 전 연대를 통틀어 본다면 무난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던 독자들에게 이 책은 타 작가들처럼 망명이란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에서 예술이란 것에 온 생애를 바치며 줄 타는 심정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한 예술가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