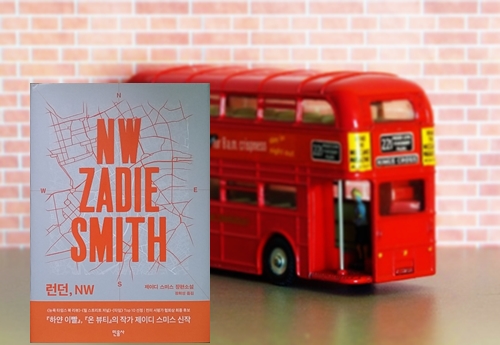 런던, NW
런던, NW
제이디 스미스 지음, 정회성 옮김 / 민음사 / 2019년 11월
제목인 ‘NW’는 런던의 북서부 지역을 의미하는 우편 기호라고 한다.
영국의 지리적으로나 행정체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우선 접해본 작가의 작품, 오늘날의 영국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느낀 작품이다.
NW의 저소득층 주택단지 중 콜드웰에서 자라고 성장한 네 사람의 이야기는 저마다 각기 다른 방향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그린다.
런던 시민인 리아, 내털리, 필릭스, 네이선은 콜드웰에서 자랐다.
리아와 내털리 네이선은 서로 학교나 성장 배경의 공통점을 통해 알고 있는 사이다.
리아와 내털리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사이, 리아는 백인, 내털리는 자메이카 이민 세대의 후손이다.
서로 다른 피부색이지만 어린 시절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이 말해주듯 친하게 지냈듯 하지만 어느 순간 멀어졌다 만남을 반복하게 되고 이들 중 성공한 사람은 내털리뿐이다.
마리와, 코카인, 여러 명의 자식들, 종교의 힘으로 뭉쳐 사는 아프리카 이민세대들, 그 누구도 콜드웰을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은 막막하고 갑갑하기만 하다.
리아 또한 아프리카계 프랑스 흑인인 미용사 미셸과 올리브란 개와 함께 살아가며 마리화나를 달고 사는 여인이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샤라는 여인의 긴박한 구조 요청은 그녀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게 되면서 다른 이들의 삶과도 연관이 된다.
책의 구성은 리아, 내털리의 성장 배경을 통해 NW의 모습을 그린다.
복잡한 구성의 집안에서 벗어나고자 공부에만 몰두했던 내털리는 변호사로서 성공, 자신 또한 흑인과 이탈리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남편 은행 투자가 프랭크와 성공한 부부로서 살아간다.
어느 날 리아의 부부를 상류층 인사들이 가득한 자신의 파티에 초대한 내털리-
.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체감하는 리아 부부는 성공한 친구의 부부를 보면서 또 다른 감정을 갖게 한다.
책 속에서 보인 등장인물들의 삶은 가난에 찌들고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 많은 가족들에 둘러싸인 채 약물중독, 폭력이 그칠 날 없는 그날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인다.
이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해 교수나 윗 상사들에게 돈과는 연관이 상관없는 태도를 보였던 내털리, 결국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그녀 친정 식구들의 삶은 벽을 허물지 못한 현실 앞에 답답함과 그녀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그녀 자신의 삶을 지치게 만든다.
**** 그들은 내털리가 지닌 법조계에 대한 윤리관과 강한 도덕성과 돈에 무관심한 태도를 듣기 거북할 정도로 칭찬했다. 그러면서 내털리가 자랐고 현재 일하는 동네를 넌지시 암시하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지껄이곤 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털리가 자란 동네는 희망이 없는 곳이자 교전 지역 비슷한 곳이었다. – p 403
보란 듯이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태생과 인종적인 한계에 부딪치는 내털리의 마음, 이곳을 빨리 벗어나 자신의 아이들만큼은 다른 곳에 자라게 하고 싶은 미셸과는 달리 피임약 복용을 통해 임신을 거부하는 리아, 책 말미의 뜻하지 않게 이어지는 네이선과의 관계는 저자가 그렸던 영국의 가감 없는 현실의 한 부분을 그렸다.
필릭스 또한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왔지만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과정은 저소득층이자 이민 세대의 후손들로서 영국이란 나라에서 살아가는 힘든 또다른 단면의 삶을 보인다.
이렇듯 찬란한 대영제국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영국이란 나라지만 저자의 글을 통한 그들의 제국주의의 산물이자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인 이민세대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의 배경 또한 영국 런던 북서부 브렌트에서 자메이카 이민자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렇기에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유럽이라는 대륙에서 이민자들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현실, 성공을 원하지만 그곳을 벗어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환경의 한계를 통해 영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을 비춘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다.
읽기엔 수월한 문장들이 아닌 끊어지듯 연결되는 패턴이 방해가 된 작품, 책 말미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은 의외의 결말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한 작품이었다.

